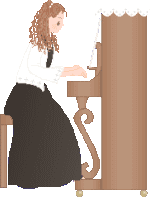 6.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다시 펜을 들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글의 시작은 당신께 제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글을 끝을 못낼 것만 같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날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다녀가신 뒤에 또 사흘이 흐른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 놓고,
어느 순간의 저를 보면 당신에게 이미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흘 후면 정말 당신은 이 땅에 없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데도 당신은 떠나시는 겁니까?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곳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이와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사십 평생이 있는 여기를 말이에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당신과 저 사이에 생긴 것이지요.
당신의 그 결정이 저는 고맙기만 해서 따라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가는 것에 비하면 제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에.
여기에 올 때만 해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쩌나,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더 어려워 보여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못 가겠다 하고, 당신은 날을 받아 놓고 있다니.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신다고 펜을 놓고서 한 줄도 더 이어 쓰지 못한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눈먼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께선 지난 사흘 동안 방에서 일어서시면 상가에 가셔서
송아지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남겨지더군요.
점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평생을 춥게 살아 가신 분, 가여우신 분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머니께서 나이 차도 꽤 나는 그 점촌 할머니와 늘 가까이 지내셨던 것은
언젠가 당신이 열흘 동안 겪은 경험으로
그 분의 쓰라리고 고됨을 이해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여가 나가는 날이라 아버지께서도 나가셨습니다.
우사에서 눈먼 송아지의 입술을 제 어미의 젖꼭지에 대 주고
도랑가로 나와 철길 너머를 바라봤는데, 점촌 할머니 떠나시는, 모습이......
하얗게...... 멀리 보이더군요.
여기 올 땐 그저 봄이 왔었을 뿐인데, 상여 나가는 그 앞산에 눈길을 줘 보니,
연푸름이 짙어지고, 늦봄 철쭉이 만발해서는 그 자리에 불을 지를 듯, 그렇게 붉었어요...... .
우사의 어미소는 제 새끼가 눈먼 것을 아직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젖을 놓친 송아지가 다시 젖을 못 물고 배를 더듬거리면,
뒷발을 들어 송아지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어리광 그만 부리라는 뜻이겠지요.
하긴 송아지 자신도 자기가 눈먼 걸 모를 테지요.
태를 끊었을 때부터 칠흑이었을테니 세상이 그런 줄, 그런 줄로만 알겠지요.
대신에 제 어미의 기척에 예민합니다.
옆에 있던 어미가 부시럭거리면 저도 부시럭거리고,
제 어미가 일어서면 저도 이엉차,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너무나 맑습니다.
그 눈에 제 눈을 헹궈 내고 싶을 정도로요.
헹궈 낸 후에 곧 제 눈앞도 칠흑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했으면......
오늘도 더는 못 쓰겠군요.
이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쓴단 말인가요!
......그 여자같이 되고 싶다......
그 희망은 그 여자가, 아기 그네에 병아리색 이불을 깔아서거나,
숙주나물에 청포묵을 얹어 줄 줄 알았던 여자여서만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오빠들 속에 섞여 있는 저를 알아봐 줬던 것입니다.
위로 오빠 셋만 있는 집의 여자아이란, 어디에 있어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요.
다 자라서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만그만하게 자라고 있는 중에는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진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내셨답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 양념딸이 났다고 반가워하시면서요.
하지만 곧 저의 존재는 집 안팎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지요.
제가 뒤란에서 울고 있거나,
제가 앞집 아이가 신은 색동 코고뭇신을 신고 싶어 애달아하는 것,
오빠가 입던 스웨터는 제가 입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을 다 내버려둔 거지요.
맞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상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저를 알아봐 줬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날,
느닷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감기를 앓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아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그 날 제게 우산을 받쳐 주며 말했지요.
상습범이라고 생각 마십시오, 독감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여자는 무슨 까닭인지 틈만 나면 칫솔질을 했어요.
밥 먹은 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큰오빠가 방문을 꽉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도,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둘째 오빠가 아줌마, 술집에서 왔지? 라고 말했을 때도,
그 때 국민학교에 막 들어간 셋째 오빠가
한밤중에 엄마 내놓으라고 발뻗고 숨넘어갈 듯이 울어제낄 때......
그 여자는 칫솔에 흰 치약을 많이 묻혀 오랫동안 칫솔질을 했습니다.
역시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제가 뒤따라 다니며,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어린애를 꼬집어 울릴 때도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여자는 빨랫줄에 방금 물에서 막 헹궈 낸
흰 기저귀를 널다 말고 칫솔에 치약을 묻혔어요.
저는 그 때 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도 그 여자처럼 이를 닦아 보고 싶어졌어요.
칫솔 통에서 제 칫솔을 꺼내 저도 치약을 묻혔죠.
저는 그때껏 그 여자가 칫솔질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울고 있더군요. 벌써 그 때 눈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우는 모습을 제게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오른손으로 닦도록 해,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는 제 칫솔을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칫솔을 입에 집어넣고 건성으로 쓱쓱 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칫솔을 쥔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싸쥐더니
입 속에서 칫솔을 둥글게 둥글게 돌려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잇몸이 안 다쳐. 저는 그 때 잇몸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잇몸이라고 발음했을 때,
그 여자의 눈물이 제 손등으로 툭 떨어져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6.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다시 펜을 들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글의 시작은 당신께 제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글을 끝을 못낼 것만 같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날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다녀가신 뒤에 또 사흘이 흐른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 놓고,
어느 순간의 저를 보면 당신에게 이미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흘 후면 정말 당신은 이 땅에 없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데도 당신은 떠나시는 겁니까?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곳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이와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사십 평생이 있는 여기를 말이에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당신과 저 사이에 생긴 것이지요.
당신의 그 결정이 저는 고맙기만 해서 따라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가는 것에 비하면 제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에.
여기에 올 때만 해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쩌나,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더 어려워 보여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못 가겠다 하고, 당신은 날을 받아 놓고 있다니.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신다고 펜을 놓고서 한 줄도 더 이어 쓰지 못한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눈먼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께선 지난 사흘 동안 방에서 일어서시면 상가에 가셔서
송아지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남겨지더군요.
점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평생을 춥게 살아 가신 분, 가여우신 분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머니께서 나이 차도 꽤 나는 그 점촌 할머니와 늘 가까이 지내셨던 것은
언젠가 당신이 열흘 동안 겪은 경험으로
그 분의 쓰라리고 고됨을 이해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여가 나가는 날이라 아버지께서도 나가셨습니다.
우사에서 눈먼 송아지의 입술을 제 어미의 젖꼭지에 대 주고
도랑가로 나와 철길 너머를 바라봤는데, 점촌 할머니 떠나시는, 모습이......
하얗게...... 멀리 보이더군요.
여기 올 땐 그저 봄이 왔었을 뿐인데, 상여 나가는 그 앞산에 눈길을 줘 보니,
연푸름이 짙어지고, 늦봄 철쭉이 만발해서는 그 자리에 불을 지를 듯, 그렇게 붉었어요...... .
우사의 어미소는 제 새끼가 눈먼 것을 아직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젖을 놓친 송아지가 다시 젖을 못 물고 배를 더듬거리면,
뒷발을 들어 송아지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어리광 그만 부리라는 뜻이겠지요.
하긴 송아지 자신도 자기가 눈먼 걸 모를 테지요.
태를 끊었을 때부터 칠흑이었을테니 세상이 그런 줄, 그런 줄로만 알겠지요.
대신에 제 어미의 기척에 예민합니다.
옆에 있던 어미가 부시럭거리면 저도 부시럭거리고,
제 어미가 일어서면 저도 이엉차,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너무나 맑습니다.
그 눈에 제 눈을 헹궈 내고 싶을 정도로요.
헹궈 낸 후에 곧 제 눈앞도 칠흑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했으면......
오늘도 더는 못 쓰겠군요.
이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쓴단 말인가요!
......그 여자같이 되고 싶다......
그 희망은 그 여자가, 아기 그네에 병아리색 이불을 깔아서거나,
숙주나물에 청포묵을 얹어 줄 줄 알았던 여자여서만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오빠들 속에 섞여 있는 저를 알아봐 줬던 것입니다.
위로 오빠 셋만 있는 집의 여자아이란, 어디에 있어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요.
다 자라서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만그만하게 자라고 있는 중에는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진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내셨답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 양념딸이 났다고 반가워하시면서요.
하지만 곧 저의 존재는 집 안팎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지요.
제가 뒤란에서 울고 있거나,
제가 앞집 아이가 신은 색동 코고뭇신을 신고 싶어 애달아하는 것,
오빠가 입던 스웨터는 제가 입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을 다 내버려둔 거지요.
맞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상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저를 알아봐 줬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날,
느닷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감기를 앓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아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그 날 제게 우산을 받쳐 주며 말했지요.
상습범이라고 생각 마십시오, 독감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여자는 무슨 까닭인지 틈만 나면 칫솔질을 했어요.
밥 먹은 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큰오빠가 방문을 꽉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도,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둘째 오빠가 아줌마, 술집에서 왔지? 라고 말했을 때도,
그 때 국민학교에 막 들어간 셋째 오빠가
한밤중에 엄마 내놓으라고 발뻗고 숨넘어갈 듯이 울어제낄 때......
그 여자는 칫솔에 흰 치약을 많이 묻혀 오랫동안 칫솔질을 했습니다.
역시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제가 뒤따라 다니며,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어린애를 꼬집어 울릴 때도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여자는 빨랫줄에 방금 물에서 막 헹궈 낸
흰 기저귀를 널다 말고 칫솔에 치약을 묻혔어요.
저는 그 때 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도 그 여자처럼 이를 닦아 보고 싶어졌어요.
칫솔 통에서 제 칫솔을 꺼내 저도 치약을 묻혔죠.
저는 그때껏 그 여자가 칫솔질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울고 있더군요. 벌써 그 때 눈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우는 모습을 제게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오른손으로 닦도록 해,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는 제 칫솔을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칫솔을 입에 집어넣고 건성으로 쓱쓱 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칫솔을 쥔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싸쥐더니
입 속에서 칫솔을 둥글게 둥글게 돌려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잇몸이 안 다쳐. 저는 그 때 잇몸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잇몸이라고 발음했을 때,
그 여자의 눈물이 제 손등으로 툭 떨어져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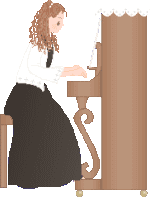 6.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다시 펜을 들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글의 시작은 당신께 제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글을 끝을 못낼 것만 같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날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다녀가신 뒤에 또 사흘이 흐른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 놓고,
어느 순간의 저를 보면 당신에게 이미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흘 후면 정말 당신은 이 땅에 없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데도 당신은 떠나시는 겁니까?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곳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이와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사십 평생이 있는 여기를 말이에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당신과 저 사이에 생긴 것이지요.
당신의 그 결정이 저는 고맙기만 해서 따라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가는 것에 비하면 제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에.
여기에 올 때만 해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쩌나,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더 어려워 보여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못 가겠다 하고, 당신은 날을 받아 놓고 있다니.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신다고 펜을 놓고서 한 줄도 더 이어 쓰지 못한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눈먼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께선 지난 사흘 동안 방에서 일어서시면 상가에 가셔서
송아지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남겨지더군요.
점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평생을 춥게 살아 가신 분, 가여우신 분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머니께서 나이 차도 꽤 나는 그 점촌 할머니와 늘 가까이 지내셨던 것은
언젠가 당신이 열흘 동안 겪은 경험으로
그 분의 쓰라리고 고됨을 이해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여가 나가는 날이라 아버지께서도 나가셨습니다.
우사에서 눈먼 송아지의 입술을 제 어미의 젖꼭지에 대 주고
도랑가로 나와 철길 너머를 바라봤는데, 점촌 할머니 떠나시는, 모습이......
하얗게...... 멀리 보이더군요.
여기 올 땐 그저 봄이 왔었을 뿐인데, 상여 나가는 그 앞산에 눈길을 줘 보니,
연푸름이 짙어지고, 늦봄 철쭉이 만발해서는 그 자리에 불을 지를 듯, 그렇게 붉었어요...... .
우사의 어미소는 제 새끼가 눈먼 것을 아직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젖을 놓친 송아지가 다시 젖을 못 물고 배를 더듬거리면,
뒷발을 들어 송아지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어리광 그만 부리라는 뜻이겠지요.
하긴 송아지 자신도 자기가 눈먼 걸 모를 테지요.
태를 끊었을 때부터 칠흑이었을테니 세상이 그런 줄, 그런 줄로만 알겠지요.
대신에 제 어미의 기척에 예민합니다.
옆에 있던 어미가 부시럭거리면 저도 부시럭거리고,
제 어미가 일어서면 저도 이엉차,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너무나 맑습니다.
그 눈에 제 눈을 헹궈 내고 싶을 정도로요.
헹궈 낸 후에 곧 제 눈앞도 칠흑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했으면......
오늘도 더는 못 쓰겠군요.
이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쓴단 말인가요!
......그 여자같이 되고 싶다......
그 희망은 그 여자가, 아기 그네에 병아리색 이불을 깔아서거나,
숙주나물에 청포묵을 얹어 줄 줄 알았던 여자여서만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오빠들 속에 섞여 있는 저를 알아봐 줬던 것입니다.
위로 오빠 셋만 있는 집의 여자아이란, 어디에 있어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요.
다 자라서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만그만하게 자라고 있는 중에는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진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내셨답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 양념딸이 났다고 반가워하시면서요.
하지만 곧 저의 존재는 집 안팎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지요.
제가 뒤란에서 울고 있거나,
제가 앞집 아이가 신은 색동 코고뭇신을 신고 싶어 애달아하는 것,
오빠가 입던 스웨터는 제가 입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을 다 내버려둔 거지요.
맞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상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저를 알아봐 줬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날,
느닷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감기를 앓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아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그 날 제게 우산을 받쳐 주며 말했지요.
상습범이라고 생각 마십시오, 독감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여자는 무슨 까닭인지 틈만 나면 칫솔질을 했어요.
밥 먹은 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큰오빠가 방문을 꽉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도,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둘째 오빠가 아줌마, 술집에서 왔지? 라고 말했을 때도,
그 때 국민학교에 막 들어간 셋째 오빠가
한밤중에 엄마 내놓으라고 발뻗고 숨넘어갈 듯이 울어제낄 때......
그 여자는 칫솔에 흰 치약을 많이 묻혀 오랫동안 칫솔질을 했습니다.
역시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제가 뒤따라 다니며,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어린애를 꼬집어 울릴 때도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여자는 빨랫줄에 방금 물에서 막 헹궈 낸
흰 기저귀를 널다 말고 칫솔에 치약을 묻혔어요.
저는 그 때 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도 그 여자처럼 이를 닦아 보고 싶어졌어요.
칫솔 통에서 제 칫솔을 꺼내 저도 치약을 묻혔죠.
저는 그때껏 그 여자가 칫솔질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울고 있더군요. 벌써 그 때 눈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우는 모습을 제게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오른손으로 닦도록 해,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는 제 칫솔을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칫솔을 입에 집어넣고 건성으로 쓱쓱 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칫솔을 쥔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싸쥐더니
입 속에서 칫솔을 둥글게 둥글게 돌려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잇몸이 안 다쳐. 저는 그 때 잇몸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잇몸이라고 발음했을 때,
그 여자의 눈물이 제 손등으로 툭 떨어져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
6.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다시 펜을 들면서 저는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 글의 시작은 당신께 제 마음을 전해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글을 끝을 못낼 것만 같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날은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당신이 이곳을 다녀가신 뒤에 또 사흘이 흐른 것입니다.
당신에게 제가 당신 앞에 나타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해 놓고,
어느 순간의 저를 보면 당신에게 이미 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나흘 후면 정말 당신은 이 땅에 없으십니까?
제가 당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데도 당신은 떠나시는 겁니까?
저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 곳을 떠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이와 당신의 아내와 그리고 당신의 사십 평생이 있는 여기를 말이에요.
무슨 영화 속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 당신과 저 사이에 생긴 것이지요.
당신의 그 결정이 저는 고맙기만 해서 따라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두고 가는 것에 비하면 제 것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기에.
여기에 올 때만 해도 당신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쩌나,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저보다 더 어려워 보여서요.
그런데 저는 지금 못 가겠다 하고, 당신은 날을 받아 놓고 있다니.
바깥에서 아버지께서 부르신다고 펜을 놓고서 한 줄도 더 이어 쓰지 못한 지난 사흘 동안,
저는 눈먼 송아지를 돌봤습니다.
어머니께선 지난 사흘 동안 방에서 일어서시면 상가에 가셔서
송아지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으로 남겨지더군요.
점촌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평생을 춥게 살아 가신 분, 가여우신 분입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어머니께서 나이 차도 꽤 나는 그 점촌 할머니와 늘 가까이 지내셨던 것은
언젠가 당신이 열흘 동안 겪은 경험으로
그 분의 쓰라리고 고됨을 이해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여가 나가는 날이라 아버지께서도 나가셨습니다.
우사에서 눈먼 송아지의 입술을 제 어미의 젖꼭지에 대 주고
도랑가로 나와 철길 너머를 바라봤는데, 점촌 할머니 떠나시는, 모습이......
하얗게...... 멀리 보이더군요.
여기 올 땐 그저 봄이 왔었을 뿐인데, 상여 나가는 그 앞산에 눈길을 줘 보니,
연푸름이 짙어지고, 늦봄 철쭉이 만발해서는 그 자리에 불을 지를 듯, 그렇게 붉었어요...... .
우사의 어미소는 제 새끼가 눈먼 것을 아직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젖을 놓친 송아지가 다시 젖을 못 물고 배를 더듬거리면,
뒷발을 들어 송아지의 엉덩이를 때립니다.
어리광 그만 부리라는 뜻이겠지요.
하긴 송아지 자신도 자기가 눈먼 걸 모를 테지요.
태를 끊었을 때부터 칠흑이었을테니 세상이 그런 줄, 그런 줄로만 알겠지요.
대신에 제 어미의 기척에 예민합니다.
옆에 있던 어미가 부시럭거리면 저도 부시럭거리고,
제 어미가 일어서면 저도 이엉차, 일어섭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은 너무나 맑습니다.
그 눈에 제 눈을 헹궈 내고 싶을 정도로요.
헹궈 낸 후에 곧 제 눈앞도 칠흑이 되어서 당신이 다시 와도 알아보지 못했으면......
오늘도 더는 못 쓰겠군요.
이 심정으로 어떻게 제가 왜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쓴단 말인가요!
......그 여자같이 되고 싶다......
그 희망은 그 여자가, 아기 그네에 병아리색 이불을 깔아서거나,
숙주나물에 청포묵을 얹어 줄 줄 알았던 여자여서만은 아닙니다.
그 여자는 오빠들 속에 섞여 있는 저를 알아봐 줬던 것입니다.
위로 오빠 셋만 있는 집의 여자아이란, 어디에 있어도 보이지 않게 마련이지요.
다 자라서는 모르겠지만 서로 그만그만하게 자라고 있는 중에는 말이에요.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진 마을 사람들에게 막걸리를 내셨답니다.
아들만 있는 집에 양념딸이 났다고 반가워하시면서요.
하지만 곧 저의 존재는 집 안팎에서 뒤처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둔 거지요.
제가 뒤란에서 울고 있거나,
제가 앞집 아이가 신은 색동 코고뭇신을 신고 싶어 애달아하는 것,
오빠가 입던 스웨터는 제가 입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들을 다 내버려둔 거지요.
맞습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상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자가 저를 알아봐 줬기 때문이에요.
당신을 처음 만난 그 날,
느닷없이 내리는 비를 맞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여자들 중에서
감기를 앓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저라는 걸 알아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은 그 날 제게 우산을 받쳐 주며 말했지요.
상습범이라고 생각 마십시오, 독감을 앓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 여자는 무슨 까닭인지 틈만 나면 칫솔질을 했어요.
밥 먹은 후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큰오빠가 방문을 꽉 잠그고 나오지 않을 때도,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둘째 오빠가 아줌마, 술집에서 왔지? 라고 말했을 때도,
그 때 국민학교에 막 들어간 셋째 오빠가
한밤중에 엄마 내놓으라고 발뻗고 숨넘어갈 듯이 울어제낄 때......
그 여자는 칫솔에 흰 치약을 많이 묻혀 오랫동안 칫솔질을 했습니다.
역시 큰오빠의 사주를 받은 제가 뒤따라 다니며,
그 여자의 등에 업힌 어린애를 꼬집어 울릴 때도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여자는 빨랫줄에 방금 물에서 막 헹궈 낸
흰 기저귀를 널다 말고 칫솔에 치약을 묻혔어요.
저는 그 때 마루에 걸터앉아 물끄러미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도 그 여자처럼 이를 닦아 보고 싶어졌어요.
칫솔 통에서 제 칫솔을 꺼내 저도 치약을 묻혔죠.
저는 그때껏 그 여자가 칫솔질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울고 있더군요. 벌써 그 때 눈이 시뻘개져 있었어요.
그 여자는, 우는 모습을 제게 보인 것이 민망했는지,
오른손으로 닦도록 해, 하면서 왼손에 쥐고 있는 제 칫솔을 오른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칫솔을 입에 집어넣고 건성으로 쓱쓱 거리고 있는데,
그 여자는 칫솔을 쥔 제 손을 자신의 손으로 싸쥐더니
입 속에서 칫솔을 둥글게 둥글게 돌려 닦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야 잇몸이 안 다쳐. 저는 그 때 잇몸이 뭔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잇몸이라고 발음했을 때,
그 여자의 눈물이 제 손등으로 툭 떨어져서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