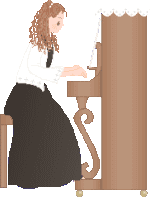 10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거의 한 달을 글을 못 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맥이 풀려서 다시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글이 목적을 잃어버린 탓도 있었겠지요.
표적이 당신이었는데, 어느새 제 글은 무목의 화살이 돼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즐거움들이 고통이나 슬픔,
허무로 바뀌어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처음 며칠은,
마비된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회오리가 다시 시작된 것만 같더군요.
제게 있어 어떤 중요한 것을 내놓아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니,
저는 벼랑 앞에 선 것같이 아찔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났는가? 정말 가 버렸는가?
전화는 당신 아내가 받더군요.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름을 또박또박 대며 바꿔 달라고 했을 때만도,
당신은 정말 가 버렸는가? 가슴이 불덩이 같았지요.
당신 아내 옆엔 당신의 아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선아, 아빠에게 전화 받으시라고 해.
저는 가만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은선이었군요.
은선이. 그 애의 이름을 서너 번 불러 봤어요.
나물 같은 이름. 어디에 고여 있었는지 눈물이 오래 쏟아졌어요.
은선이.
방문을 열어 보니 마당의 감나무에 감꽃이 하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자 환한 햇살이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대문까지 나오는데 서너 번은 무릎이 꺾였어요.
회복기 환자의 걸음걸이가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방 안에 제가 누워 있는 동안 봄 농사일은 이미 시작이 돼서,
들판에 수건을 쓴 여인들이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갓 돋아났던 파란 쑥들은 너무 웃자라 쇠어 있었고,
팔레트 속의 물감들 같던 꽃들도 그 사이 덧없이 지고,
어느새 푸른 잎새들이 그 꽃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걸어다니는 동안 제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봄꽃들은
무엇이 급해 잎도 돋기 전에 저희들이 그리 피어났다가
저리 속절없이 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볕 바른 골목에서는 두 여자아이가,
한때는 뭉게구름 같았으나 너펄너펄 져 버린
누런 목련잎을 찧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피는 모습을 봤으니 지는 모습도 봐야 하는 거겠지요.
제 얼굴은 지금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해졌습니다.
일손이 귀한 곳이라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를 거들기 시작한 일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봐야 새참 준비하는 일이나,
고구마순 모종하는 일 정도뿐이지마는요.
그래도 눈먼 송아지는 제가 우사의 문을 열면
제 발 소리를 알아듣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 곳에 와서 가장 친해진 대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첨엔, 눈먼 놈이라......기가 막히더마는 무던하다.
먹고 잠 잘자니 살이 몽실몽실 올랐어야,
제값 받기엔 별 무리 없겄다! 하실 땐
그 송아지를 짐승으로만 생각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친해졌어요.
어머니께선 본격적으로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서 다시 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생한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을 얻기까지 제가 한 일이란, 이 글을 쓰다 말다 한 것뿐이지요.
이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토록 힘든 것을 모르고서 저는,
이 마을에 내려와 제 마음결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께 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번 일도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한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 짓지도 못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나는 여기에 있잖아요.
어제는 빨래터에서 이 사실이 어찌나 낯선지 물밑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 화르르 흩어지는 송사리 떼들......
그래도 몇 년만에......숨을...... 깊은...... 숨을......들이쉬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당신께, 이미 거기 계시는 당신께 부칠 필욘 이제 없겠지요.
그래도......까치, 까치 얘기는 쓰렵니다.
이 마을에 온 첫날 그렇게 부지런히 둥지를 틀던 까치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더군요.
옥수수 씨를 심을 구덩이를 파느라고 산밭에 다녀오다가 봤어요.
먼발치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중 어느 새끼도 눈먼 새는 없는 듯했어요.
세 마리 모두 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 오니까
서로 밀치며 소란스럽게 한껏 입을 벌리는데,
입속이 온통 빨갛...... 새빨갰어요.
그 새끼 까치들이 날갯짓을 할 무렵이면 이 곳도,
여기 이 고장에도 초여름, 여름......이겠지요.
저기 저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 짙어져서는 초록이, 진초록이......될 테지요.
그 때쯤엔, 은선이란 당신 아이 이름도 제 가슴에서 아련해질는지,
안녕.
10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거의 한 달을 글을 못 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맥이 풀려서 다시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글이 목적을 잃어버린 탓도 있었겠지요.
표적이 당신이었는데, 어느새 제 글은 무목의 화살이 돼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즐거움들이 고통이나 슬픔,
허무로 바뀌어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처음 며칠은,
마비된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회오리가 다시 시작된 것만 같더군요.
제게 있어 어떤 중요한 것을 내놓아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니,
저는 벼랑 앞에 선 것같이 아찔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났는가? 정말 가 버렸는가?
전화는 당신 아내가 받더군요.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름을 또박또박 대며 바꿔 달라고 했을 때만도,
당신은 정말 가 버렸는가? 가슴이 불덩이 같았지요.
당신 아내 옆엔 당신의 아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선아, 아빠에게 전화 받으시라고 해.
저는 가만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은선이었군요.
은선이. 그 애의 이름을 서너 번 불러 봤어요.
나물 같은 이름. 어디에 고여 있었는지 눈물이 오래 쏟아졌어요.
은선이.
방문을 열어 보니 마당의 감나무에 감꽃이 하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자 환한 햇살이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대문까지 나오는데 서너 번은 무릎이 꺾였어요.
회복기 환자의 걸음걸이가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방 안에 제가 누워 있는 동안 봄 농사일은 이미 시작이 돼서,
들판에 수건을 쓴 여인들이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갓 돋아났던 파란 쑥들은 너무 웃자라 쇠어 있었고,
팔레트 속의 물감들 같던 꽃들도 그 사이 덧없이 지고,
어느새 푸른 잎새들이 그 꽃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걸어다니는 동안 제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봄꽃들은
무엇이 급해 잎도 돋기 전에 저희들이 그리 피어났다가
저리 속절없이 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볕 바른 골목에서는 두 여자아이가,
한때는 뭉게구름 같았으나 너펄너펄 져 버린
누런 목련잎을 찧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피는 모습을 봤으니 지는 모습도 봐야 하는 거겠지요.
제 얼굴은 지금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해졌습니다.
일손이 귀한 곳이라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를 거들기 시작한 일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봐야 새참 준비하는 일이나,
고구마순 모종하는 일 정도뿐이지마는요.
그래도 눈먼 송아지는 제가 우사의 문을 열면
제 발 소리를 알아듣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 곳에 와서 가장 친해진 대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첨엔, 눈먼 놈이라......기가 막히더마는 무던하다.
먹고 잠 잘자니 살이 몽실몽실 올랐어야,
제값 받기엔 별 무리 없겄다! 하실 땐
그 송아지를 짐승으로만 생각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친해졌어요.
어머니께선 본격적으로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서 다시 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생한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을 얻기까지 제가 한 일이란, 이 글을 쓰다 말다 한 것뿐이지요.
이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토록 힘든 것을 모르고서 저는,
이 마을에 내려와 제 마음결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께 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번 일도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한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 짓지도 못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나는 여기에 있잖아요.
어제는 빨래터에서 이 사실이 어찌나 낯선지 물밑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 화르르 흩어지는 송사리 떼들......
그래도 몇 년만에......숨을...... 깊은...... 숨을......들이쉬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당신께, 이미 거기 계시는 당신께 부칠 필욘 이제 없겠지요.
그래도......까치, 까치 얘기는 쓰렵니다.
이 마을에 온 첫날 그렇게 부지런히 둥지를 틀던 까치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더군요.
옥수수 씨를 심을 구덩이를 파느라고 산밭에 다녀오다가 봤어요.
먼발치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중 어느 새끼도 눈먼 새는 없는 듯했어요.
세 마리 모두 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 오니까
서로 밀치며 소란스럽게 한껏 입을 벌리는데,
입속이 온통 빨갛...... 새빨갰어요.
그 새끼 까치들이 날갯짓을 할 무렵이면 이 곳도,
여기 이 고장에도 초여름, 여름......이겠지요.
저기 저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 짙어져서는 초록이, 진초록이......될 테지요.
그 때쯤엔, 은선이란 당신 아이 이름도 제 가슴에서 아련해질는지,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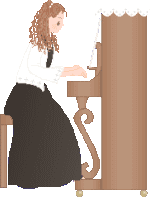 10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거의 한 달을 글을 못 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맥이 풀려서 다시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글이 목적을 잃어버린 탓도 있었겠지요.
표적이 당신이었는데, 어느새 제 글은 무목의 화살이 돼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즐거움들이 고통이나 슬픔,
허무로 바뀌어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처음 며칠은,
마비된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회오리가 다시 시작된 것만 같더군요.
제게 있어 어떤 중요한 것을 내놓아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니,
저는 벼랑 앞에 선 것같이 아찔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났는가? 정말 가 버렸는가?
전화는 당신 아내가 받더군요.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름을 또박또박 대며 바꿔 달라고 했을 때만도,
당신은 정말 가 버렸는가? 가슴이 불덩이 같았지요.
당신 아내 옆엔 당신의 아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선아, 아빠에게 전화 받으시라고 해.
저는 가만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은선이었군요.
은선이. 그 애의 이름을 서너 번 불러 봤어요.
나물 같은 이름. 어디에 고여 있었는지 눈물이 오래 쏟아졌어요.
은선이.
방문을 열어 보니 마당의 감나무에 감꽃이 하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자 환한 햇살이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대문까지 나오는데 서너 번은 무릎이 꺾였어요.
회복기 환자의 걸음걸이가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방 안에 제가 누워 있는 동안 봄 농사일은 이미 시작이 돼서,
들판에 수건을 쓴 여인들이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갓 돋아났던 파란 쑥들은 너무 웃자라 쇠어 있었고,
팔레트 속의 물감들 같던 꽃들도 그 사이 덧없이 지고,
어느새 푸른 잎새들이 그 꽃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걸어다니는 동안 제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봄꽃들은
무엇이 급해 잎도 돋기 전에 저희들이 그리 피어났다가
저리 속절없이 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볕 바른 골목에서는 두 여자아이가,
한때는 뭉게구름 같았으나 너펄너펄 져 버린
누런 목련잎을 찧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피는 모습을 봤으니 지는 모습도 봐야 하는 거겠지요.
제 얼굴은 지금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해졌습니다.
일손이 귀한 곳이라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를 거들기 시작한 일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봐야 새참 준비하는 일이나,
고구마순 모종하는 일 정도뿐이지마는요.
그래도 눈먼 송아지는 제가 우사의 문을 열면
제 발 소리를 알아듣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 곳에 와서 가장 친해진 대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첨엔, 눈먼 놈이라......기가 막히더마는 무던하다.
먹고 잠 잘자니 살이 몽실몽실 올랐어야,
제값 받기엔 별 무리 없겄다! 하실 땐
그 송아지를 짐승으로만 생각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친해졌어요.
어머니께선 본격적으로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서 다시 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생한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을 얻기까지 제가 한 일이란, 이 글을 쓰다 말다 한 것뿐이지요.
이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토록 힘든 것을 모르고서 저는,
이 마을에 내려와 제 마음결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께 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번 일도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한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 짓지도 못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나는 여기에 있잖아요.
어제는 빨래터에서 이 사실이 어찌나 낯선지 물밑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 화르르 흩어지는 송사리 떼들......
그래도 몇 년만에......숨을...... 깊은...... 숨을......들이쉬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당신께, 이미 거기 계시는 당신께 부칠 필욘 이제 없겠지요.
그래도......까치, 까치 얘기는 쓰렵니다.
이 마을에 온 첫날 그렇게 부지런히 둥지를 틀던 까치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더군요.
옥수수 씨를 심을 구덩이를 파느라고 산밭에 다녀오다가 봤어요.
먼발치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중 어느 새끼도 눈먼 새는 없는 듯했어요.
세 마리 모두 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 오니까
서로 밀치며 소란스럽게 한껏 입을 벌리는데,
입속이 온통 빨갛...... 새빨갰어요.
그 새끼 까치들이 날갯짓을 할 무렵이면 이 곳도,
여기 이 고장에도 초여름, 여름......이겠지요.
저기 저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 짙어져서는 초록이, 진초록이......될 테지요.
그 때쯤엔, 은선이란 당신 아이 이름도 제 가슴에서 아련해질는지,
안녕.
10 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거의 한 달을 글을 못 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맥이 풀려서 다시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 글이 목적을 잃어버린 탓도 있었겠지요.
표적이 당신이었는데, 어느새 제 글은 무목의 화살이 돼 버린 것입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즐거움들이 고통이나 슬픔,
허무로 바뀌어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던 처음 며칠은,
마비된 듯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젠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회오리가 다시 시작된 것만 같더군요.
제게 있어 어떤 중요한 것을 내놓아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니,
저는 벼랑 앞에 선 것같이 아찔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떠났는가? 정말 가 버렸는가?
전화는 당신 아내가 받더군요.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름을 또박또박 대며 바꿔 달라고 했을 때만도,
당신은 정말 가 버렸는가? 가슴이 불덩이 같았지요.
당신 아내 옆엔 당신의 아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선아, 아빠에게 전화 받으시라고 해.
저는 가만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은선이었군요.
은선이. 그 애의 이름을 서너 번 불러 봤어요.
나물 같은 이름. 어디에 고여 있었는지 눈물이 오래 쏟아졌어요.
은선이.
방문을 열어 보니 마당의 감나무에 감꽃이 하얗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깥으로 나오자 환한 햇살이 너무나 어지러웠어요.
대문까지 나오는데 서너 번은 무릎이 꺾였어요.
회복기 환자의 걸음걸이가 아마 그런 것이겠지요.
방 안에 제가 누워 있는 동안 봄 농사일은 이미 시작이 돼서,
들판에 수건을 쓴 여인들이 모판에 볍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갓 돋아났던 파란 쑥들은 너무 웃자라 쇠어 있었고,
팔레트 속의 물감들 같던 꽃들도 그 사이 덧없이 지고,
어느새 푸른 잎새들이 그 꽃자리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걸어다니는 동안 제 마음이 조금은 평온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봄꽃들은
무엇이 급해 잎도 돋기 전에 저희들이 그리 피어났다가
저리 속절없이 질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볕 바른 골목에서는 두 여자아이가,
한때는 뭉게구름 같았으나 너펄너펄 져 버린
누런 목련잎을 찧어서 소꿉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피는 모습을 봤으니 지는 모습도 봐야 하는 거겠지요.
제 얼굴은 지금 볕에 그을려 가무스름해졌습니다.
일손이 귀한 곳이라 더 이상 방 안에 있을 수만은 없어서
어머니를 거들기 시작한 일이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그래 봐야 새참 준비하는 일이나,
고구마순 모종하는 일 정도뿐이지마는요.
그래도 눈먼 송아지는 제가 우사의 문을 열면
제 발 소리를 알아듣고 몸을 일으킵니다.
이 곳에 와서 가장 친해진 대상입니다.
아버지께서,
첨엔, 눈먼 놈이라......기가 막히더마는 무던하다.
먹고 잠 잘자니 살이 몽실몽실 올랐어야,
제값 받기엔 별 무리 없겄다! 하실 땐
그 송아지를 짐승으로만 생각하시는 아버지 마음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친해졌어요.
어머니께선 본격적으로 모심기가 시작되기 전에
어서 다시 그 곳으로 가라 하십니다. 고생한다고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평온을 얻기까지 제가 한 일이란, 이 글을 쓰다 말다 한 것뿐이지요.
이 편지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토록 힘든 것을 모르고서 저는,
이 마을에 내려와 제 마음결에 일어난 일들을
당신께 글로 쓸 수 있다고 믿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번 일도 제 인생을 제가 조정한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무리 짓지도 못했는데,
당신은 거기에, 나는 여기에 있잖아요.
어제는 빨래터에서 이 사실이 어찌나 낯선지 물밑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 화르르 흩어지는 송사리 떼들......
그래도 몇 년만에......숨을...... 깊은...... 숨을......들이쉬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당신께, 이미 거기 계시는 당신께 부칠 필욘 이제 없겠지요.
그래도......까치, 까치 얘기는 쓰렵니다.
이 마을에 온 첫날 그렇게 부지런히 둥지를 틀던 까치가 새끼 세 마리를 낳았더군요.
옥수수 씨를 심을 구덩이를 파느라고 산밭에 다녀오다가 봤어요.
먼발치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 중 어느 새끼도 눈먼 새는 없는 듯했어요.
세 마리 모두 다 어미가 먹이를 물어 오니까
서로 밀치며 소란스럽게 한껏 입을 벌리는데,
입속이 온통 빨갛...... 새빨갰어요.
그 새끼 까치들이 날갯짓을 할 무렵이면 이 곳도,
여기 이 고장에도 초여름, 여름......이겠지요.
저기 저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 짙어져서는 초록이, 진초록이......될 테지요.
그 때쯤엔, 은선이란 당신 아이 이름도 제 가슴에서 아련해질는지,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