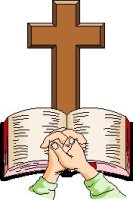
기도인도시 기억할 사항 10가지
장례 분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장례문화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용어이다. 그런 까닭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교회에서도 흔히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보게 된다. 예를 들면 어느 장례예식에서 목사가 “이제 침묵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는 경우도 있었고, 조문객이 문상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인사를 한다. 그러나 ’명복(冥福)’이라는 용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 말은 불교의 전용어로서 불교 신자가 죽은 후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곳을 명부(冥府)라 하는데 거기서 받게 되는 복을 가리킨 말이다. 곧, 죽은 자들이 복된 심판을 받아 극락에 가게 되기를 바란다는 불교의 내세관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이러한 용어가 지금껏 교회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교회에서는 그러한 용어 대신 순수하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든지, 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와 같은 말로 유족을 위로함이 타당하다.
미망인 →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
미망인(未亡人)이라는 용어는 순장(殉葬)제도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속을 말한다. 이러한 풍속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와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특히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분신 자살하여 순장되는 ‘사티?라는 풍습이 1829년 법으로써 금지되기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22대 지증왕 3년(주후 502년)에 왕명에 의하여 순장 금지되기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속되었다. 이런 순장제도가 성행할 때나 쓰일 수 있었던 ‘미망인’ 이라는 용어의 뜻을 풀어 보면 “남편이 죽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인데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용어의 뜻을 알았을 때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말임을 깨닫게 된다.
칠성판(七星板)→ 고정판 또는 시정판
우리의 장례문화에 변화가 일고 있으나 아직껏 가정에서 죽음을 맞은 경우가 많으며 그 때마다 목회자가 직접 시신을 다루는 일이 많다. 이때 시신이 반듯하게 굳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널빤지를 시신 밑에 깔고 손발의 위치를 반듯이 잡아 준다. 여기에 사용되는 널빤지 사용의 전통적인 관례가 이 널빤지에 북두칠성을 본 따서 일곱 개의 구멍을 뚫었다 하여 ‘칠성판’이라 부른다. 흔히 우리 교회에서도 적당한 이름을 못 찾아 ‘칠성판’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유래는 별이 인간의 길흉화복과 수명을 지배한다는 도교의 믿음에서 시작되었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토속 신앙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시신을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순수하게 ‘고정판(固定板)’ 또는 ‘시정판(屍定板)’으로 부름이 타당하다.
영결식, 고별식 →장례예식
인간이 세상을 떠났을 때 진행하는 예식을 칭하는 용어로서 ‘영결식’. ‘고별식’. ‘발인식’ 등 다양한 명칭이 있다. 그러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이 우리의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영결식은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이며 고별식은 ‘작별을 고한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교리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표현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발인식은 시신을 담은 상여가 집에서 떠남을 뜻하기에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 이러한 용어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본 교단 총회에서는 표준 예식서를 통하여 이미 장례예식으로 정리하였기에 이제는 모두가 ‘장례예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해야 한다.
삼우제(三虞祭)→ 첫 성묘(省墓)
우제(虞祭)란 장례를 마친 뒤에 지내는 제사로서 우리의 장례문화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다. 이 때의 제사는 세 번 갖게 되는데 그것을 초우(初虞) 재우(再虞) 삼우(三虞)라 한다. 이 중에 아직도 삼우제라는 이름은 교회 안팎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의 삼우제는 장사 지낸 뒤 3일 만에 묘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하는 관례로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성묘란 시체를 묻고 뫼를 만드는 일, 즉 산역(山役)이 잘 되었는가를 살피는 것이 주목적이다. 아직도 매장 문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한국 교회에서는 가족들이 3일만에 성묘를 하는 일이 보편적이다. 삼우제라는 이름을 ‘첫 성묘’로 부르는것이 매우 적절한 용어라고 본다.
예수 → 예수님, 성령 → 성령님
우리의 언어문화는 윗분들을 호칭할 때 ‘님’자의 사용을 엄격하게 가르친다. 특히 자신이 섬기는 신의 존재를 호칭할 때는 ’님‘자 또는 그 이상의 존칭어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불교의 신도들은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과 같이 철저히 ’님‘자를 사용하여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 우리의 기독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되 그 위(位)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분하게 되어있다. 성삼위가 동격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한동안 논쟁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그러나 325년 니케야 공회의에서는 제2 위격 예수님의 신성문제가 확정되었고,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제3 위이신 성령님의 신성문제를 확정하였다. 이로써 삼위일체의 교리는 기독교에 정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성삼위는 동격이신데 어느 위에는 ‘님’자를 붙여 호칭을 하고, 어느 위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예수님’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호칭할 때도 ‘님’자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성령님의 역사’로 언어의 순화를 가져 올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가장 큰 용어의 잘못 사용은 축복의 말, 격려의 말이나 사랑의 말이 아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 비판하는 말일 것입니다. 또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라고 하는 의미를 기억하고 그 말의 의미를 삶 속에서 잘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출처ⓒ† :
'━━ 영성을 위한 ━━ > 기독교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리하는 예배를 위한 체크리스트 (0) | 2022.07.16 |
|---|---|
| 기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0) | 2022.07.15 |
| 기도인도시 기억할 사항 10가지 (0) | 2022.07.13 |
| 기도인도시 기억할 사항 10가지 (0) | 2022.07.12 |
|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0) | 2022.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