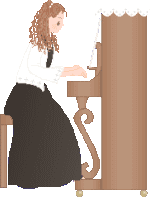 2.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여섯 살이었을까, 아니면 일곱 살?
막냇동생이 막 태어나던 해 였으니, 일곱 살이 맞겠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누군가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란 것으로 보면 어쩌면 어머니를 기다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그 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매달려 있던 검정 고무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마당의 늦봄 볕을 거느린 듯 화사했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그토록 뽀얀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을을 단 한 번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어린 저는,
머리에 땀이 밴 수건을 쓴 여자,
제사장에 오를 홍어 껍질을 억척스럽게 벗기고 있는 여자,
얼굴의 주름 사이로까지 땟국 물이 흐르는 여자,
호박 구덩이에 똥물을 붓고 있는 여자,
뙤약볕 아래 고추 모종하는 여자,
된장 속에 들끓는 장벌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내는 여자,
산에 가서 갈퀴나무를 한 짐씩 해서 지고 내려오는 여자,
들깻잎에 달라붙은 푸른 깨벌레를 깨물어도 그냥 삼키는 여자,
샛거리로 먹을 막걸리와, 호미, 팔 토시가 담긴 소쿠리를 옆구리에 낀 여자,
아궁이의 불을 뒤적이던 부지깽이로 말 안 듣는 아들을 패는 여자,
고무신에 황토 흙이 덕지덕지 묻은 여자,
방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잠꼬대하는 여자,
굵은 종아리에 논물에 사는 거머리가 물어뜯어 놓은 상처가 서너 개씩은 있는 여자,
계절 없이 살갗이 튼 여자......
이렇듯 일에 찌들어 손금이 쩍쩍 갈라진 강팍한 여자들만 보아 왔던 것이나,
그 여자의 뽀얌에 눈이 둥그렇게 되었던 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텃밭이 어디니?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여자는 어느덧 부엌에서 소쿠리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서 있었지요.
저는 그 여자의 화사함에 이끌려 고무신을 꿰신고,
그 여자를 뒤세우고는 텃밭으로 난 샛문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그때껏 제가 맡아 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내는 그 여자에게서 조금 빠져나와 제게 스미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리 저를 어지럽게 하던 지요.
텃밭으로 가는 길에 물을 길어 나르던 장성 댁을 만났는데,
장성 댁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샐쭉한 표정으로.
그 여자는 잔 배추와 잔 배추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소쿠리에 잔 배추를 뽑았습니다.
텃밭 한 켠에 심겨진 푸르른 조선파도 뽑아 담았습니다.
여자는 새각시처럼 뉴똥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배추를 뽑을 때는 배춧잎같이, 파를 뽑을 때는 팟잎같이 파랗게 고왔습니다.
텃밭 지기 노랑나비도 그 여자 머리 위에 내려앉으니 날개를 바꿔 단은 듯했어요.
텃밭에 들어갔다 나오자 여자의 흰코 고무신에 흙이 얼룩졌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제 손을 이끌고 다시 샛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온 그 여자가 맨 먼저 한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을 해주었어요.
생강 껍질도 벗겨 주고, 마늘도 짓찧어 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서툰 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채 써는 일은 특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깍둑깍둑깍둑...... 경쾌했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깍...... 뚝...... 깍...... 뚝...... 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방 아기 그네에 백일이 겨우 지난 막냇동생까지 남겨 두고.
여자는 힘들게 김치를 담가서 저녁 밥상을 차려 내놓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오빠가 윗목에 버티고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점심도 못 먹었던 터라 밥상이 나오자, 수저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오빠의 매서운 눈초리에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밥들 먹어!
여자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우리는 큰오빠의 위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진 입을 꽉 다문 큰오빠를 지나
어두워진 마당을 담배를 피우며 내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네 속의 막냇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큰오빠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도전장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모두 나를 따라나와.
그 때 막 중학생이 되었던 까까머리 큰오빠는 무슨 마피아의 두목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제끼는 강보의 동생과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맞비비고 있는 그 여자와,
뽀끔뽀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아버지를 남겨 둔 채
우리는 어린 두목에게 이끌려 마을 다리로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우리 셋을 나란히 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어.
오늘 집에 온 그 여자는 악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빨아 준 옷은 입지도 말아라.
성아, 왜?
큰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물었던 사람은
그 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바로 위 오빠였습니다.
배고픈데, 성!
바로 위 오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 듯 했어요.
제 심정도 그 오빠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얼마나 뽀얀 가요.
큰오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해야만 어머니가 돌아온단 말이다!
큰오빠는 나란히 줄서 있는 우리 셋 앞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 앞에 우뚝 멈췄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특히, 너...... 너 오늘처럼 그 여잘 졸졸 따라다녔단 봐!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숨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는 중이었는데,
큰오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뒤세우고 텃밭으로 갈 때 마주쳤던 장성 댁의 그 샐쭉해지던 표정이며,
그 여자의 은은한 향기로움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것의 실체가 잡혔지요.
그 봄날, 그렇게 찾아와 우리 집에 열흘쯤 살다 간 그 여자가,
제가 이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순처럼 제 속을 뚫고 올라왔던 것이에요,
제 근원을 아프게 건드리면서.
2.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여섯 살이었을까, 아니면 일곱 살?
막냇동생이 막 태어나던 해 였으니, 일곱 살이 맞겠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누군가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란 것으로 보면 어쩌면 어머니를 기다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그 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매달려 있던 검정 고무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마당의 늦봄 볕을 거느린 듯 화사했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그토록 뽀얀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을을 단 한 번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어린 저는,
머리에 땀이 밴 수건을 쓴 여자,
제사장에 오를 홍어 껍질을 억척스럽게 벗기고 있는 여자,
얼굴의 주름 사이로까지 땟국 물이 흐르는 여자,
호박 구덩이에 똥물을 붓고 있는 여자,
뙤약볕 아래 고추 모종하는 여자,
된장 속에 들끓는 장벌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내는 여자,
산에 가서 갈퀴나무를 한 짐씩 해서 지고 내려오는 여자,
들깻잎에 달라붙은 푸른 깨벌레를 깨물어도 그냥 삼키는 여자,
샛거리로 먹을 막걸리와, 호미, 팔 토시가 담긴 소쿠리를 옆구리에 낀 여자,
아궁이의 불을 뒤적이던 부지깽이로 말 안 듣는 아들을 패는 여자,
고무신에 황토 흙이 덕지덕지 묻은 여자,
방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잠꼬대하는 여자,
굵은 종아리에 논물에 사는 거머리가 물어뜯어 놓은 상처가 서너 개씩은 있는 여자,
계절 없이 살갗이 튼 여자......
이렇듯 일에 찌들어 손금이 쩍쩍 갈라진 강팍한 여자들만 보아 왔던 것이나,
그 여자의 뽀얌에 눈이 둥그렇게 되었던 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텃밭이 어디니?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여자는 어느덧 부엌에서 소쿠리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서 있었지요.
저는 그 여자의 화사함에 이끌려 고무신을 꿰신고,
그 여자를 뒤세우고는 텃밭으로 난 샛문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그때껏 제가 맡아 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내는 그 여자에게서 조금 빠져나와 제게 스미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리 저를 어지럽게 하던 지요.
텃밭으로 가는 길에 물을 길어 나르던 장성 댁을 만났는데,
장성 댁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샐쭉한 표정으로.
그 여자는 잔 배추와 잔 배추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소쿠리에 잔 배추를 뽑았습니다.
텃밭 한 켠에 심겨진 푸르른 조선파도 뽑아 담았습니다.
여자는 새각시처럼 뉴똥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배추를 뽑을 때는 배춧잎같이, 파를 뽑을 때는 팟잎같이 파랗게 고왔습니다.
텃밭 지기 노랑나비도 그 여자 머리 위에 내려앉으니 날개를 바꿔 단은 듯했어요.
텃밭에 들어갔다 나오자 여자의 흰코 고무신에 흙이 얼룩졌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제 손을 이끌고 다시 샛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온 그 여자가 맨 먼저 한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을 해주었어요.
생강 껍질도 벗겨 주고, 마늘도 짓찧어 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서툰 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채 써는 일은 특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깍둑깍둑깍둑...... 경쾌했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깍...... 뚝...... 깍...... 뚝...... 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방 아기 그네에 백일이 겨우 지난 막냇동생까지 남겨 두고.
여자는 힘들게 김치를 담가서 저녁 밥상을 차려 내놓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오빠가 윗목에 버티고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점심도 못 먹었던 터라 밥상이 나오자, 수저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오빠의 매서운 눈초리에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밥들 먹어!
여자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우리는 큰오빠의 위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진 입을 꽉 다문 큰오빠를 지나
어두워진 마당을 담배를 피우며 내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네 속의 막냇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큰오빠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도전장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모두 나를 따라나와.
그 때 막 중학생이 되었던 까까머리 큰오빠는 무슨 마피아의 두목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제끼는 강보의 동생과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맞비비고 있는 그 여자와,
뽀끔뽀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아버지를 남겨 둔 채
우리는 어린 두목에게 이끌려 마을 다리로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우리 셋을 나란히 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어.
오늘 집에 온 그 여자는 악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빨아 준 옷은 입지도 말아라.
성아, 왜?
큰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물었던 사람은
그 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바로 위 오빠였습니다.
배고픈데, 성!
바로 위 오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 듯 했어요.
제 심정도 그 오빠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얼마나 뽀얀 가요.
큰오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해야만 어머니가 돌아온단 말이다!
큰오빠는 나란히 줄서 있는 우리 셋 앞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 앞에 우뚝 멈췄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특히, 너...... 너 오늘처럼 그 여잘 졸졸 따라다녔단 봐!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숨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는 중이었는데,
큰오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뒤세우고 텃밭으로 갈 때 마주쳤던 장성 댁의 그 샐쭉해지던 표정이며,
그 여자의 은은한 향기로움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것의 실체가 잡혔지요.
그 봄날, 그렇게 찾아와 우리 집에 열흘쯤 살다 간 그 여자가,
제가 이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순처럼 제 속을 뚫고 올라왔던 것이에요,
제 근원을 아프게 건드리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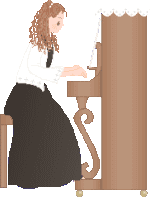 2.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여섯 살이었을까, 아니면 일곱 살?
막냇동생이 막 태어나던 해 였으니, 일곱 살이 맞겠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누군가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란 것으로 보면 어쩌면 어머니를 기다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그 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매달려 있던 검정 고무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마당의 늦봄 볕을 거느린 듯 화사했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그토록 뽀얀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을을 단 한 번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어린 저는,
머리에 땀이 밴 수건을 쓴 여자,
제사장에 오를 홍어 껍질을 억척스럽게 벗기고 있는 여자,
얼굴의 주름 사이로까지 땟국 물이 흐르는 여자,
호박 구덩이에 똥물을 붓고 있는 여자,
뙤약볕 아래 고추 모종하는 여자,
된장 속에 들끓는 장벌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내는 여자,
산에 가서 갈퀴나무를 한 짐씩 해서 지고 내려오는 여자,
들깻잎에 달라붙은 푸른 깨벌레를 깨물어도 그냥 삼키는 여자,
샛거리로 먹을 막걸리와, 호미, 팔 토시가 담긴 소쿠리를 옆구리에 낀 여자,
아궁이의 불을 뒤적이던 부지깽이로 말 안 듣는 아들을 패는 여자,
고무신에 황토 흙이 덕지덕지 묻은 여자,
방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잠꼬대하는 여자,
굵은 종아리에 논물에 사는 거머리가 물어뜯어 놓은 상처가 서너 개씩은 있는 여자,
계절 없이 살갗이 튼 여자......
이렇듯 일에 찌들어 손금이 쩍쩍 갈라진 강팍한 여자들만 보아 왔던 것이나,
그 여자의 뽀얌에 눈이 둥그렇게 되었던 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텃밭이 어디니?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여자는 어느덧 부엌에서 소쿠리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서 있었지요.
저는 그 여자의 화사함에 이끌려 고무신을 꿰신고,
그 여자를 뒤세우고는 텃밭으로 난 샛문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그때껏 제가 맡아 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내는 그 여자에게서 조금 빠져나와 제게 스미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리 저를 어지럽게 하던 지요.
텃밭으로 가는 길에 물을 길어 나르던 장성 댁을 만났는데,
장성 댁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샐쭉한 표정으로.
그 여자는 잔 배추와 잔 배추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소쿠리에 잔 배추를 뽑았습니다.
텃밭 한 켠에 심겨진 푸르른 조선파도 뽑아 담았습니다.
여자는 새각시처럼 뉴똥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배추를 뽑을 때는 배춧잎같이, 파를 뽑을 때는 팟잎같이 파랗게 고왔습니다.
텃밭 지기 노랑나비도 그 여자 머리 위에 내려앉으니 날개를 바꿔 단은 듯했어요.
텃밭에 들어갔다 나오자 여자의 흰코 고무신에 흙이 얼룩졌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제 손을 이끌고 다시 샛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온 그 여자가 맨 먼저 한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을 해주었어요.
생강 껍질도 벗겨 주고, 마늘도 짓찧어 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서툰 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채 써는 일은 특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깍둑깍둑깍둑...... 경쾌했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깍...... 뚝...... 깍...... 뚝...... 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방 아기 그네에 백일이 겨우 지난 막냇동생까지 남겨 두고.
여자는 힘들게 김치를 담가서 저녁 밥상을 차려 내놓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오빠가 윗목에 버티고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점심도 못 먹었던 터라 밥상이 나오자, 수저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오빠의 매서운 눈초리에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밥들 먹어!
여자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우리는 큰오빠의 위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진 입을 꽉 다문 큰오빠를 지나
어두워진 마당을 담배를 피우며 내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네 속의 막냇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큰오빠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도전장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모두 나를 따라나와.
그 때 막 중학생이 되었던 까까머리 큰오빠는 무슨 마피아의 두목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제끼는 강보의 동생과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맞비비고 있는 그 여자와,
뽀끔뽀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아버지를 남겨 둔 채
우리는 어린 두목에게 이끌려 마을 다리로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우리 셋을 나란히 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어.
오늘 집에 온 그 여자는 악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빨아 준 옷은 입지도 말아라.
성아, 왜?
큰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물었던 사람은
그 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바로 위 오빠였습니다.
배고픈데, 성!
바로 위 오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 듯 했어요.
제 심정도 그 오빠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얼마나 뽀얀 가요.
큰오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해야만 어머니가 돌아온단 말이다!
큰오빠는 나란히 줄서 있는 우리 셋 앞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 앞에 우뚝 멈췄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특히, 너...... 너 오늘처럼 그 여잘 졸졸 따라다녔단 봐!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숨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는 중이었는데,
큰오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뒤세우고 텃밭으로 갈 때 마주쳤던 장성 댁의 그 샐쭉해지던 표정이며,
그 여자의 은은한 향기로움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것의 실체가 잡혔지요.
그 봄날, 그렇게 찾아와 우리 집에 열흘쯤 살다 간 그 여자가,
제가 이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순처럼 제 속을 뚫고 올라왔던 것이에요,
제 근원을 아프게 건드리면서.
2.풍금이 있던 자리 - 신경숙
여섯 살이었을까, 아니면 일곱 살?
막냇동생이 막 태어나던 해 였으니, 일곱 살이 맞겠습니다.
저는 마루 끝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누군가 열린 대문을 통해 들어와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란 것으로 보면 어쩌면 어머니를 기다렸던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때 그 여자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여자가 열린 대문으로 들어섰을 때
제 발끝에 매달려 있던 검정 고무신이 툭, 떨어졌습니다.
여자는 마당의 늦봄 볕을 거느린 듯 화사했습니다.
그 때까지 저는 그토록 뽀얀 여자를 본 적이 없었어요.
마을을 단 한 번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어린 저는,
머리에 땀이 밴 수건을 쓴 여자,
제사장에 오를 홍어 껍질을 억척스럽게 벗기고 있는 여자,
얼굴의 주름 사이로까지 땟국 물이 흐르는 여자,
호박 구덩이에 똥물을 붓고 있는 여자,
뙤약볕 아래 고추 모종하는 여자,
된장 속에 들끓는 장벌레를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내는 여자,
산에 가서 갈퀴나무를 한 짐씩 해서 지고 내려오는 여자,
들깻잎에 달라붙은 푸른 깨벌레를 깨물어도 그냥 삼키는 여자,
샛거리로 먹을 막걸리와, 호미, 팔 토시가 담긴 소쿠리를 옆구리에 낀 여자,
아궁이의 불을 뒤적이던 부지깽이로 말 안 듣는 아들을 패는 여자,
고무신에 황토 흙이 덕지덕지 묻은 여자,
방바닥에 등을 대자마자 잠꼬대하는 여자,
굵은 종아리에 논물에 사는 거머리가 물어뜯어 놓은 상처가 서너 개씩은 있는 여자,
계절 없이 살갗이 튼 여자......
이렇듯 일에 찌들어 손금이 쩍쩍 갈라진 강팍한 여자들만 보아 왔던 것이나,
그 여자의 뽀얌에 눈이 둥그렇게 되었던 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텃밭이 어디니?
그 여자가 제게 다가와 제 어깨를 매만지며 물었어요.
여자는 어느덧 부엌에서 소쿠리를 들고 나와 제 앞에 서 있었지요.
저는 그 여자의 화사함에 이끌려 고무신을 꿰신고,
그 여자를 뒤세우고는 텃밭으로 난 샛문을 향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는 그때껏 제가 맡아 본 적이 없는 은은한 향내가 났습니다.
그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그 향내는 그 여자에게서 조금 빠져나와 제게 스미곤 했습니다.
그게 왜 그리 저를 어지럽게 하던 지요.
텃밭으로 가는 길에 물을 길어 나르던 장성 댁을 만났는데,
장성 댁은 물동이를 내려놓고까지 그 여자와 나를 쳐다봤어요,
샐쭉한 표정으로.
그 여자는 잔 배추와 잔 배추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소쿠리에 잔 배추를 뽑았습니다.
텃밭 한 켠에 심겨진 푸르른 조선파도 뽑아 담았습니다.
여자는 새각시처럼 뉴똥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배추를 뽑을 때는 배춧잎같이, 파를 뽑을 때는 팟잎같이 파랗게 고왔습니다.
텃밭 지기 노랑나비도 그 여자 머리 위에 내려앉으니 날개를 바꿔 단은 듯했어요.
텃밭에 들어갔다 나오자 여자의 흰코 고무신에 흙이 얼룩졌지만,
여자는 아무래도 상관없는 듯 제 손을 이끌고 다시 샛문을 통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온 그 여자가 맨 먼저 한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을 해주었어요.
생강 껍질도 벗겨 주고, 마늘도 짓찧어 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절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지요.
그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서툰 듯했어요.
어머니께서는 한눈을 파시면서도 단숨에 척척 해내는 무생채 써는 일은 특히 말이에요.
어머니의 도마질 소리는 깍둑깍둑깍둑...... 경쾌했지만,
그 여자의 도마질 소리는 깍...... 뚝...... 깍...... 뚝...... 이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안방 아기 그네에 백일이 겨우 지난 막냇동생까지 남겨 두고.
여자는 힘들게 김치를 담가서 저녁 밥상을 차려 내놓았지만,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수저를 들지 못했습니다.
큰오빠가 윗목에 버티고 앉아 눈을 부라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점심도 못 먹었던 터라 밥상이 나오자, 수저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큰오빠의 매서운 눈초리에 힘없이 내려놓았어요.
밥들 먹어!
여자는 우리 형제들을 향해 애원하듯 말했지만
우리는 큰오빠의 위세를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진 입을 꽉 다문 큰오빠를 지나
어두워진 마당을 담배를 피우며 내다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네 속의 막냇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을 때,
큰오빠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도전장처럼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모두 나를 따라나와.
그 때 막 중학생이 되었던 까까머리 큰오빠는 무슨 마피아의 두목 같았습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제끼는 강보의 동생과
어쩔 줄 모르고 손을 맞비비고 있는 그 여자와,
뽀끔뽀끔 담배 연기를 내뿜는 아버지를 남겨 둔 채
우리는 어린 두목에게 이끌려 마을 다리로 나갔습니다.
큰오빠는 우리 셋을 나란히 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중앙에 서서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오늘부터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어.
오늘 집에 온 그 여자는 악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해준 밥은 먹지도 말고,
불러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빨아 준 옷은 입지도 말아라.
성아, 왜?
큰오빠의 옷자락을 잡아끌며 물었던 사람은
그 때 저보다 한 살 많았던 바로 위 오빠였습니다.
배고픈데, 성!
바로 위 오빠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 듯 했어요.
제 심정도 그 오빠의 심정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그 여자는 얼마나 뽀얀 가요.
큰오빠는 버럭 화를 냈어요.
그렇게 해야만 어머니가 돌아온단 말이다!
큰오빠는 나란히 줄서 있는 우리 셋 앞을 서성이다가 어느 순간 제 앞에 우뚝 멈췄어요.
저는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특히, 너...... 너 오늘처럼 그 여잘 졸졸 따라다녔단 봐! 너 엄마 없이 살 수 있어?
저는 주저앉아 울음보를 터뜨려 버렸어요.
그렇잖아도 숨막히게 하는 그 무엇이 가슴을 짓누르는 중이었는데,
큰오빠가 그 이유를 정확히 집어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를 뒤세우고 텃밭으로 갈 때 마주쳤던 장성 댁의 그 샐쭉해지던 표정이며,
그 여자의 은은한 향기로움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를 어지럽게 하던 것의 실체가 잡혔지요.
그 봄날, 그렇게 찾아와 우리 집에 열흘쯤 살다 간 그 여자가,
제가 이 집에 도착해 마루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죽순처럼 제 속을 뚫고 올라왔던 것이에요,
제 근원을 아프게 건드리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