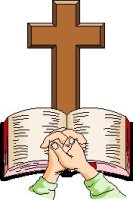
구약 정경.
1) 구약성경의 정경화
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어나자 유대인들은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게 된다. 그 중심에 유대교 최고의 랍비였던 요하난 벤 자카이(Yohanan Ben Zakai)가 있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바리새파의 대제사장으로, AD 66~70년 열심당원이 주도한 유대의 반란이 결국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유대교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당시 로마 진압군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나 최소한의 유대교 랍비의 존속을 허락 받는다.
② 그 후 AD 70년에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유대의 율법학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가까운 지중해 연안의 도시 얌니아로 대거 이주한다. 얌니아에 모인 율법학자들은 그곳에 율법 학교를 세우는 것과 종교 생활에 대한 보장을 로마 당국으로부터 허락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후 얌니아는 많은 유대교 율법학자들이 활동하는 도시가 되었다.
③ 요하난 벤 자카이는 AD 90년경에 랍비들을 불러 모아, 얌니아 지방에 있던 ‘예쉬바(Yeshiva)’라고 불리는 유대인 랍비들의 아카데미에서 구약 성경의 정경(正經)을 결정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이 회의에서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경전 목록, 즉 구약 성경의 정경을 확정한다. 이때 70인역 성경에 포함되어 있었던 일부 책들은 제외되었다. 그런데 얌니아 회의는 정경 목록을 새롭게 확정한 것이 아니라, BC 400년경에 (일설에 의하면 에스라에 의해) 일차적으로 확정된 목록을 그대로 재확인한 것이었다.
④ 그 후 개신교에서는 히브리어 경전 24권을 70인역을 따라서 39권으로 나누었다. 천주교에서는 382년 로마 주교 회의에서 헬라어 70인역의 구약 성서 46권을 정경으로 인정했고, 이것을 트리엔트 공의회(1546년)에서 다시 확인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정 리 >
① 콘스탄틴 대제의 명으로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집성(기본 문서로는 무라토리 단편, 페쉬타 역본, 고대 라틴경 등)
② 382년 로마 전체회의에서 정경목록 작성(367년 아다나시우스가 27권을 정경으로 공적 서신에서 밝힘)
③ 397년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의 주도 아래 신약 27권 정경목차 결정
2) 구약성경의 역본(譯本- Version)
① 타르굼(Targum) - 아람어 역본
⑴ BC 5, 6세기경부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아람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었고, 팔레스타인 유대 사회와 디아스포라(여러 나라로 흩어진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아람어를 쓰게 되자,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 때 통역자(메투르게만)가 등장하여 낭독되는 율법서와 예언서 관련 본문 등을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했다. 처음에는 구두(口頭)로 통역되고 전승되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 통역 내용이 일정한 형식으로 굳어졌고 기록으로 정착되었다.
⑵ 율법서 타르굼 중에는 대표적으로 온켈로스의 타르굼으로 알려진 바빌로니아 타르굼(Babylonian Targum)이 있다. 이것은 본래 팔레스타인에서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바빌로니아로 건너가 거기에서 개정되고 크게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9세기 직후에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와 다른 여러 종류의 타르굼들을 제치고 독자적 위치를 차지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온켈로스의 타르굼은 문자적인 번역이면서도 랍비들의 주석을 번역에 반영시키고 있다.
⑶ 팔레스타인 타르굼들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요나단의 타르굼이다. 요나단은 14세기경부터 생긴 이름으로서 예루살렘 타르굼(Targum Jerusalem)을 뜻하는 히브리어 약자 “TJ”를 요나단의 타르굼(Targum Jonathan)으로 잘못 읽은 데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옛 팔레스타인 타르굼(Old Palestinian Targum)과 온켈로스의 초기 번역을 뒤섞은 것이다. 랍비들의 주석, 설교, 교훈 등이 번역에 많이 첨가되어 있다.
⑷ 사마리아 5경을 번역한 타르굼도 있다. 유대인의 타르굼이 문자적인 번역인 데 비해 이것은 좀 자유스러운 번역이다. 본문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적은 없다. 예언서 타르굼도 본래는 팔레스타인에서 나왔으나 바빌로니아로 건너가 최종적으로 개정되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완성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BC 1세기말에서부터 AD 1세기초까지 활동한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의 제자 요나단 벤 우지엘의 번역으로 본다. 이것이 엄격한 문자적 번역은 아니지만 온켈로스에 의존한 증거가 많이 나타난다. 성문서의 아람어 역은 모두 5세기 이후에 나온 것들이다.
② 불가타(Vulgata) – 라틴어 역본
⑴ 불가타(Vulgata) 또는 새 라틴어 성경은 5세기 초에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불가타라는 말은 “서민판”이라는 뜻의 라틴어 에디티오 불가타(editio vulgata,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고 있다)에서 유래했다. 당시 라틴어는 몇몇 귀족 계층은 고전 라틴어에 가까운 말을 사용했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로망스어로 분화하기 직전 단계의 라틴어를 사용했다. 불가타라 이름함은 성경을 번역할 때 상류층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라 대다수 대중들이 사용하는 라틴어에 기준하여 번역했단 뜻에서 붙인 이름이다.
⑵ 불가타는 교황 다마소 1세가 히에로니무스(Hieronymus)에게 성경 번역을 지시한데서 시작한다(382년).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불가타를 개정한 새 대중 라틴어 성경(Bibliorum Sacrorum nova vulgata editio)을 발행하였는데, 이 노바 불가타가 현재 로마 가톨릭교회의 라틴 전례에서 사용되는 공식 성경이다. 구약성경의 경우 히브리어 타나크에서 라틴어로 번역한 최초의 성경이며, 이전에는 70인역에서 라틴어로 번역했었다. 역사적으로 불가타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정본이 되었고, 그래서 "번역된 출판"이라는 뜻의 불가타(versio vulgata)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⑶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와 히브리어 실력을 고루 갖춘 성경학자였다. 그는 3종류의 라틴어 〈시편〉 개정판을 낸 바 있다. 첫번째 개정은 70인역에 근거하여 개정되었으므로 < 로마 시편 >이라고도 한다. 두번째 개정은 팔레스타인에서 펴낸 것인데, 헥사플라 70인역에 입각하여 라틴어 역을 히브리어 원문 쪽에 가깝게 개정했다. 갈리아 지방에서 특히 인기가 있었으므로 < 갈리아 시편 >이라고도 한다. 후에 이 시편이 불가타 역에 그대로 들어간다. 3번째 개정은 어떤 의미에서는 개정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번역이다.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된 것이지만 널리 유포되지는 못했다.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 히에로니무스는 고대 라틴어 역을 다만 헬라어 역에 근거하여 개정한다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⑷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 성서를 히브리어 원문 성서에서 직접 번역하기 시작했는데, 390년에 시작하여 405년에 끝냈다. 그러나 이미 서방교회에서는 그리스어 70인역이 굳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므로,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역은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 정착하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의 라틴어 번역이 70인역의 내용과도 달랐고 고대 라틴어 역과도 다른 곳이 많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읽어오던 본문과 다르다고 하여 오히려 라틴어 역의 권위가 도전을 받았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지도자는 히에로니무스의 라틴어 역 성서로 인해 헬라 교회와 라틴 교회가 갈라지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걸렸지만 결국 히에로니무스의 새 라틴어 역은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8세기에 비로소 그의 번역은 라틴어 불가타가 되어서, 종교개혁 때까지 서방교회의 성경으로 자리잡았다.
⑸ 그 후로도 상당 기간 고대 라틴어 역과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역을 손으로 베껴서 보급하는 과정에서 번역문에 많은 변화가 가해져 일종의 종합 본문이 되고 말았다. 손으로 베끼는 과정에서 본문의 변화까지 겹치게 되었다. 현재 남아 있는 8,000여 개의 사본들 사이에 이독(異讀)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중세기에 불가타 역 회복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다가, 1546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불가타 역을 공인하게 됨에 따라 개정본의 필요성이 더 절실해졌고, 15세기 중엽부터 인쇄술이 발달하자 번역 본문을 정착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식스투스판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교황 클레멘스 8세가 1592년에 새 판을 간행했는데,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인 불가타가 되었다.
③ 시리아어 역본 - Peshitta
⑴ 시리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시리아 역 성경은 < 페쉬타 >(단순한 번역)라고도 알려져 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 누가 언제 번역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번역은 본래 1세기경에 번역되었던 것 같고,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의 아리아베네 지역에 있던 유대인 사회에서 번역하여 사용했던 것 같다.
⑵ < 페쉬타 >는 문체도 다양하고 채택한 번역 방법도 다양하다. 모세5경 부분은 마소라 본문과 아주 가깝지만, 다른 부분은 70인역과 가깝다. 마소라 본문과 가까운 본문은 유대교인들이 번역한 것이고, 70인역과 가까운 본문은 그리스도교 쪽의 개정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5세기 시리아 교회가 네스토리우스파(동시리아)와 야코부스파(서시리아)로 나뉘면서 페시타의 본문사도 2갈래로 갈라진다. 네스토리우스 교회는 고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교회가 간직하고 있던 사본이 덜 손상되었을 것으로 본다.
⑶ 6세기초에 마북의 감독 필록세누스가 70인역의 루시아 개정본을 근거로 페쉬타를 개정했다. 617년에는 헥사플라에 들어 있는 시리아어 역을 텔라의 주교인 파울루스가 < 헥사플라 70인역 >에 근거하여 개정했다. 지금 단편만 남아 있는 팔레스타인 시리아 역은 에데사의 야코부스가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현존하는 페쉬타 사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442년에 나온 것이다.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4권의 코덱스는 5~12세기 때의 것이다. 아직 비평적 편집본은 없으나, 국제구약학회가 준비하고 있다.
'━━ 영성을 위한 ━━ > 기독교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약성경 출현의 과정. (0) | 2021.09.29 |
|---|---|
| 신약성경 출현의 과정. (0) | 2021.09.28 |
| 기독교 재물관 (0) | 2021.09.26 |
| 믿음과 기적? (0) | 2021.09.25 |
| 믿음과 기적? (0) |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