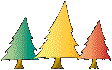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9.28 수복 전야에 진영(塵纓)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 도로(京仁 道路)에서 본 괴뢰군의 임종(臨終) 이야기를 했다.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 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 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
소년 병은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行人) 한 사람이
노상에 굴러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짜개서 그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 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을 잃은 진영은 1․4후퇴 때
세 살 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나 안양(安養)에 이르기도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우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졌다.
피난 짐을 끌던 소는 굴레를 찬 채 둑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은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文秀)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잡풀 속에 박힌 기왓장 밑에서 물씬 물씬 무너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 文學의 展望』이라는 일본 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에 꽂혔을 때 --
순간 진영의 머리 속에 그러한 회상이 환각(幻覺)처럼 지난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 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아홉 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날 문수는 죽어 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붙어서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을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腦手術)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한 아이는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 갔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버린 진영이였다.
바깥 거리에는 솨아!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득인다.
창백한 볼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肺結核)에서 오는 발열(發熱)이다.
바깥의 빗소리가 줄기차 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달, 그러나 천 년이나 된 듯한 긴 날이었다.
진영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진영의 귀에 조수(潮水)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이켠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셔 보라고 동무가 보내준 포도주였다.
이불 위에 엎드린 진영은 여울처럼 멀어지는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잠이 든다.
진영은 꿈 속에서 희미한 길을 마구 쏘다니며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붕대를 칭칭 감은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는 아이 모습에 소스라쳐 깬다.
흠씬 땀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별안간 무서움이 쭉 끼친다.
비가 멎은 새벽이 창가로부터 서서히 방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허공을 보고 있는 진영은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알 수 가 없었다.
아이가 이미 유명(幽冥)의 혼령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글픈 인간 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요다음 주일 날에는 꼭 나를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갈월동(葛月洞)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한 일이 생각난다.
바로 오늘이 그 주일날이다.
갈월동의 아주머니는 약속한 대로 여덟 시가 못 되어서 왔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죽은 진영의 칠촌 아저씨의 마누라였다.
자식도 없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天主敎)의 신자였으나
근래에 와서 계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을 빚었다.
진영이만 해도 그 짤짤 끓는 돈으로 겨우 다 넣어 온
이십만 환짜리 계를 소롯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만큼 계주를 한 아주머니의 사정이 핍박했던 것이다.
매미 날개같이 손질을 한 모시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할 적에는 금으로 씌운 송곳니가 알른알른 보였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손을 잡고 손자를 잃은 하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어머니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진영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 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불신 시대 - 박경리
9.28 수복 전야에 진영(塵纓)의 남편은 폭사했다.
남편은 죽기 전에 경인 도로(京仁 道路)에서 본 괴뢰군의 임종(臨終) 이야기를 했다.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었다는 것이다.
그 소년병은 가로수 밑에 쓰러져 있었는데
폭풍으로 터져 나온 내장에 피비린내를 맡은 파리 떼들이
아귀처럼 덤벼들고 있더라는 것이다.
소년 병은 물 한 모금 달라고 애걸을 하면서도 꿈결처럼 어머니를 부르더라는 것이다.
그것을 본 행인(行人) 한 사람이
노상에 굴러있는 수박 한 덩이를 돌로 짜개서 그 소년에게 주었더니
채 그것을 먹지도 못하고 숨이 지더라는 것이다.
남편은 마치 자신의 죽음의 예고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수 시간 후에 폭사하고 만 것이다.
남편을 잃은 진영은 1․4후퇴 때
세 살 먹이 아이를 업고 친정어머니와 같이 제일 마지막에 서울에서 떠났다.
그러나 안양(安養)에 이르기도 전에 중공군이 그들을 앞질렀고, 유우엔군의 폭격 밑에 놓였다.
수없는 피난민이 얼음판에 거꾸러졌다.
피난 짐을 끌던 소는 굴레를 찬 채 둑 밑으로 굴렀다.
피가 철철 흐르는 시체 옆에 아이가 울고 있었다.
진영은 눈을 가리고 달아났던 것이다.
악몽과 같은 전쟁이 끝났다.
진영은 아들 문수(文秀)의 손을 잡고 황폐한 서울로 돌아왔다.
집터는 쑥대밭이 되어 축대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진영은 잡풀 속에 박힌 기왓장 밑에서 물씬 물씬 무너지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랑스 文學의 展望』이라는 일본 책이었다.
이 책이 책장에 꽂혔을 때 --
순간 진영의 머리 속에 그러한 회상이 환각(幻覺)처럼 지난다.
진영은 무심한 아이의 눈동자를 멍하니 언제 까지나 바라보고 있었다.
문수가 자라서 아홉 살이 된 초여름
진영은 내장이 터져서 파리가 엉겨붙은 소년병을 꿈에 보았다.
마치 죽음의 예고처럼 다음날 문수는 죽어 버린 것이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다.
일찍부터 홀로 되어 외동딸인 진영에게 붙어서 살아온 어머니는
내가 죽을 것을 하며 문지방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이었으나 진영은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는 앓다가 죽은 것이 아니었다.
길에서 넘어지고 병원에서 죽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차라리 진영으로서는
전쟁이 빚어낸 하나의 악몽처럼 차차 잊어버릴 수 있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의사의 무관심이 아이를 거의 생죽음을 시킨 것이다.
의사는 중대한 뇌수술(腦手術)을 엑스레이도 찍어보지 않고,
심지어는 약 준비조차 없이 시작했던 것이다.
마취도 안한 아이는 도수장(屠獸場) 속의 망아지처럼 죽어 갔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버린 진영이였다.
바깥 거리에는 솨아! 하며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누워서 멀거니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진영의 눈동자가 이따금 불빛에 번득인다.
창백한 볼이 불그스름해진다.
폐결핵(肺結核)에서 오는 발열(發熱)이다.
바깥의 빗소리가 줄기차 온다.
아이가 죽은 지 겨우 한달, 그러나 천 년이나 된 듯한 긴 날이었다.
진영은 가만히 눈을 감는다.
진영의 귀에 조수(潮水)처럼 밀려오는 것은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진영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술병을 들이켠다.
잠이 오지 않을 때 마셔 보라고 동무가 보내준 포도주였다.
이불 위에 엎드린 진영은 여울처럼 멀어지는 수술실 속의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 잠이 든다.
진영은 꿈 속에서 희미한 길을 마구 쏘다니며 아이를 찾아 헤매다가
붕대를 칭칭 감은 눈도, 코도, 입도, 보이지 않는 아이 모습에 소스라쳐 깬다.
흠씬 땀에 젖은 몸이 가늘게 떨고 있었다.
별안간 무서움이 쭉 끼친다.
비가 멎은 새벽이 창가로부터 서서히 방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허공을 보고 있는 진영은 왜 무서움을 느끼는지 알 수 가 없었다.
아이가 이미 유명(幽冥)의 혼령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글픈 인간 관계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은 구역이 나올 정도로 자기 자신이 싫었다.
성당의 종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요다음 주일 날에는 꼭 나를 성당에 데려가 달라고
갈월동(葛月洞)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한 일이 생각난다.
바로 오늘이 그 주일날이다.
갈월동의 아주머니는 약속한 대로 여덟 시가 못 되어서 왔다.
아주머니는 옛날에 죽은 진영의 칠촌 아저씨의 마누라였다.
자식도 없는 그는 아주 독실한 천주교(天主敎)의 신자였으나
근래에 와서 계로 인해서 상당히 말썽을 빚었다.
진영이만 해도 그 짤짤 끓는 돈으로 겨우 다 넣어 온
이십만 환짜리 계를 소롯이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만큼 계주를 한 아주머니의 사정이 핍박했던 것이다.
매미 날개같이 손질을 한 모시옷을 입은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데
아주머니가 말할 적에는 금으로 씌운 송곳니가 알른알른 보였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언제나 손을 잡고 손자를 잃은 하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어머니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우시지 마세요, 형님. 산 사람 생각도 하셔야지. 진영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살아 갈 길이나 생각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