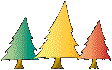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이 실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길도 막연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고름을 여미여
(아주머니는 적삼에도 반드시 고름을 달았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 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 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좀 밝아진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리에 나왔다.
아침이라 가로수가 서늘했다.
본시 불교도인 어머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꺼렸으나,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의사는 항상 딸에게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주머니는 진영의 양산 밑으로 바싹 다가오면서 소곤거리기 시작한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아주머니는 말했다.
진영은 땅을 내려다본 채,
「지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갔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암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연장자(年長者)답게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말투가 너무 어수룩했다.
「아무리 꽃동산이래도 그 애는 외로울 게요.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진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보았다.
너울처럼 엷은 구름이 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해. 상배(相培)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먼 지평선(地平線)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진영은 기계적으로,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심경이 많이 변했어」
분 냄새가 엷게 풍겨 온다.
진영은 금니가 알른알른 보이는 아주머니의 입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배는 아주머니 댁에 하숙한 대학생이다.
지나간 봄에만 해도 그는
「아주머니요, 예수가 물위로 걸었다캤능기요.
하핫핫! 아마 예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던가 배요. 하하핫……」
그런 부산 사투리의 조롱이 자기 딴에는 아주 신통했던지
상배는 콧마루를 벌름거리며 웃었던 것이다.
진영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이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 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 받도록 하려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이 성당 앞까지 왔을 때 은행나무에 자잘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뜰에는 연 분홍빛 글라디올러스가 피어 있었는데
진영은 불교의 상징인 연화(軟化)를 왜 그런지 연상했다.
그리고 엉뚱스럽게 그 꽃들이 자아내는 서양과 동양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영은 얼떨떨하게 자기의 마음을 더듬었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뵈러온 마당에서 아무런 경건함도 없이
이렇게 냉정히 사물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만 시각(視覺)에서 온 하나의 자연발상(自然發想)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슬픔 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말인가.
진영은 문수에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진영은 땀에 젖은 분 냄새가 풍겨오는 아주머니의 젖가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 성경책 같은 것을 노점처럼 벌여놓고 팔고 있었다.
진영은 어느 유역의 이방인(異邦人)인 양 그런 광경을 건너다보았다.
분위기에 싸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쌀쌀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진영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시간이 돼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아주머니의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으라 해 놓고 신 도둑질하더라,
그런 야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진영은 곧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신전(神殿)에서 신을 모독하다니--
그런 죄악 의식에 쫓기며 진영은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미사는 시작되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은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헤살군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헤살군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 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캄캄해 오는 것을 느낀다.
헤살군은 속삭이다.
칼끝으로 골을 짜개서 죽여 버린 것이다.
무참하게 죽여 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 앞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
헤살군은 자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冥府)에서 압축한 듯한 목쉰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코 앞에 닿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땀내가 뭉클 풍겨온다.
현기증을 느낀다.
신자들이 머리에 쓴 하얀 미사포가 시계(視界)와 의식을 하나로 표백(漂白)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제품이 정렬한 듯한 성가대(聖歌隊)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각색의 음계가 합한 성가는 바람을 못 마신 오르간의 잡음처럼 진영의 귓가에 울렸다.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을 을씨년스런 자기 자신의 모습,
진영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위치인가를 깨닫는다.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진영은 잃어진 낭만(浪漫)을 찾아보듯이
신과 문수의 죽음이 동렬(同列)의 신비(神秘)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신과 죽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했다.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이 실직을 하고 있는 형편이라 살길도 막연하긴 했다.
아주머니는 갖가지 말로 어머니를 달래다가 풀어진 고름을 여미여
(아주머니는 적삼에도 반드시 고름을 달았다),
「우리 어디 사는 대로 살아 봅시다……
그리고 나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형님 돈만큼은 돌려 드리려고. 원금만이라도요……」
어머니의 얼굴이 좀 밝아진다.
진영은 잠자코 양말을 신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거리에 나왔다.
아침이라 가로수가 서늘했다.
본시 불교도인 어머니는 성당으로 가는 것이 마음에 꺼렸으나, 그러나 아무래도 좋았다.
의사는 항상 딸에게 있는 것이었으니까…….
아주머니는 진영의 양산 밑으로 바싹 다가오면서 소곤거리기 시작한다.
「천주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불행하지 않다.
천주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어 너를 부르신 거야.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인간 세상에 다만 천주님만이 빛이 된다.」
신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똑같은 말을 아주머니는 말했다.
진영은 땅을 내려다본 채,
「지가 구원을 받자고 가는 건 아니에요.
천당이 있어서 그곳에 문수가 놀고 있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래, 천당 갔다.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암 행복하게 꽃동산에서 놀고 있고 말고」
연장자(年長者)답게 위로하는 것이었으나 말투가 너무 어수룩했다.
「아무리 꽃동산이래도 그 애는 외로울 게요. 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진영은 혼자 중얼거리며 하늘을 보았다.
너울처럼 엷은 구름이 가고 있었다.
「그런 소리 말고 영세나 받도록 해. 상배(相培)도 영세를 벌써 받았어」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먼 지평선(地平線)에서 울려오는 것 같았다.
진영은 기계적으로,
「그 무신론자가…… 영세를……?」
「그 애도 요즘 심경이 많이 변했어」
분 냄새가 엷게 풍겨 온다.
진영은 금니가 알른알른 보이는 아주머니의 입매를 물끄러미 쳐다본다.
상배는 아주머니 댁에 하숙한 대학생이다.
지나간 봄에만 해도 그는
「아주머니요, 예수가 물위로 걸었다캤능기요.
하핫핫! 아마 예수는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올렸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올렸던가 배요. 하하핫……」
그런 부산 사투리의 조롱이 자기 딴에는 아주 신통했던지
상배는 콧마루를 벌름거리며 웃었던 것이다.
진영이 그것을 생각하는 동안 아주머니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그 애도 우리 집에서 쉬이 옮기게 될 거야.
아버지가 사업 때문에 서울로 오신 다니까…
그래서 나도 그 애가 나가기 전에 영세 받도록 하려고……」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그들이 성당 앞까지 왔을 때 은행나무에 자잘한 햇빛이 부서지고 있었다.
뜰에는 연 분홍빛 글라디올러스가 피어 있었는데
진영은 불교의 상징인 연화(軟化)를 왜 그런지 연상했다.
그리고 엉뚱스럽게 그 꽃들이 자아내는 서양과 동양의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것이었다.
막연한 생각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진영은 얼떨떨하게 자기의 마음을 더듬었다.
문수를 위하여 신을 뵈러온 마당에서 아무런 경건함도 없이
이렇게 냉정히 사물을 헤아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다만 시각(視覺)에서 온 하나의 자연발상(自然發想)이라고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 슬픔 속에 그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말인가.
진영은 문수에게 부끄러웠다. 미안했다.
진영은 땀에 젖은 분 냄새가 풍겨오는 아주머니의 젖가슴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나무 그늘 아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옆에는 중년 남자 한 사람이 십자가, 성경책 같은 것을 노점처럼 벌여놓고 팔고 있었다.
진영은 어느 유역의 이방인(異邦人)인 양 그런 광경을 건너다보았다.
분위기에 싸이지 않는 마음속에는 쌀쌀한 바람이 일고 있었다.
진영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아주머니는 신발을 책보에 싸면서,
「주로 아이들을 위한 미사시간이 돼서 시끄러워. 다음엔 일찍 와요」
진영은 아주머니의 말보다 거추장스럽게 신발을 싸들고 가는
신자들의 모습에 눈이 따라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문득, 예수 사랑하려고 예배당에 갔더니 눈감으라 해 놓고 신 도둑질하더라,
그런 야유에 찬 노래를 생각했다.
그러나 진영은 곧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다.
신전(神殿)에서 신을 모독하다니--
그런 죄악 의식에 쫓기며 진영은 아주머니의 뒤를 따랐다.
얼마 후에 미사는 시작되었다.
「가엾은 나의 아들 문수를 위하여 기도를 올리나이다.
진심으로…… 진실로 비나이다.
그 고통으로부터 놓이게 하시고, 어린 영혼에게 평화가 있기를……」
진영은 눈은 감고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헤살군의 속삭임이 더 집요했다.
헤살군은 속삭인다.
문수는 죽어 버린 것이다.
아주 영영 없어진 것이다.
진영은 눈앞이 캄캄해 오는 것을 느낀다.
헤살군은 속삭이다.
칼끝으로 골을 짜개서 죽여 버린 것이다.
무참하게 죽여 버린 것이다.
진영은 눈 앞에 시뻘건 불덩어리가 굴러가는 것을 본다.
헤살군은 자꾸만 속삭인다.
어둡고 침침한 명부(冥府)에서 압축한 듯한 목쉰 아이의 울음소리,
진영은 땀을 흘리며, 눈을 떴다.
코 앞에 닿은 어머니의 머리에서 땀내가 뭉클 풍겨온다.
현기증을 느낀다.
신자들이 머리에 쓴 하얀 미사포가 시계(視界)와 의식을 하나로 표백(漂白)시켜 버리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났는지 진영은 고개를 돌렸다.
구제품이 정렬한 듯한 성가대(聖歌隊)의 아이들이 눈앞에 나타났다.
아이들의 각색의 음계가 합한 성가는 바람을 못 마신 오르간의 잡음처럼 진영의 귓가에 울렸다.
이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을 을씨년스런 자기 자신의 모습,
진영은 그것이 얼마나 어설픈 위치인가를 깨닫는다.
진영은 다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미웠다.
결코 자기라는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미웠던 것이다.
진영은 어떻게 해서라도 객관적인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진영은 잃어진 낭만(浪漫)을 찾아보듯이
신과 문수의 죽음이 동렬(同列)의 신비(神秘)라는 것,
그리고 아무도 신과 죽음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라 생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