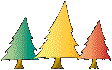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이 처음 성당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가공에 설정된 하나의 가장일지라도
다만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이야 피에로도 오똑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맹목(盲目)은 끝내 맹목일 수 없었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다 연금(捐金) 주머니를 여민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돈을 몇 닢 던졌을 때,
잠자리채 같은 연금 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구경꾼 앞으로 돌아가는 풍각쟁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하여 진영은 밖으로 나와 버렸다.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성당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또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여름 햇빛 아래 서 있는 성당이 가늘게 요동(搖動)하고 있는 것같이 진영에게는 느껴졌다.
아침부터 진영은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갑하게 그러지 말고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도리어 비위에 거슬려 진영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부여안는다.
갑갑한 때문만이 아니다.
진영은 일자리를 찾아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진영은 머리를 부여안은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밥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버둥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루 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당에는 대낮 햇빛이 쨍쨍 쏟아지고 있었다.
그늘이 짧아진 쌍나무의 둘레로 잉잉거리고 다니던 파리 떼들이 진영의 얼굴 위에 몰린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빨래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넓적한 해바라기 잎사귀 사이의 그 찌드른 옆얼굴을 바라보는 진영은
바다에 떼밀려 다니는 해파리를 생각했다.
그렇게 둔하면서도 산다는 본능만은 가진 것, 그저 산다는 것,
진영은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그런 주시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진영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쫓으며 마룻바닥에 드러눕는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갑자기 바다같이 느껴졌다.
구름은 바다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해파리만 같았다.
진영이 자신이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엎드려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착각이 든다.
해가 서쪽으로 좀 기울었다. 쌍나무의 그늘이 두서너 치나 늘어난 것 같다.
진영은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마루 밑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삐걱 하더니 열린다.
땅을 보고 있던 진영의 눈에 우선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눈을 치떴을 때 그곳에 바랑을 짊어진 신중이 서 있었다.
초현실파의 그림같이 그림자를 밟고 선 신중의 소리 없는 기다란 모습.
드디어 합장을 하고 있던 신중이 입을 열었다.
「아씨!」
완전히 조화를 깨뜨린 소녀와도 같이 카랑카랑하게 맑은 목소리다.
바랑에 휘인 어깨는 아무래도 사십 고개일 터인데 --
신중은 부스스 일어나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진영의 형용할 수 없는 어두운 눈빛에 지친다.
마침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는 어머니를 본 신중은 잠시 숨을 돌이킨 듯이,
「마나님!」
의연히 맑은 목소리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쉰다.
「이날까지 부처님을 섬기고 잘 살 적에는 절마다 불을 켰건만 무슨 소용이 있읍디까.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헛말이더군……」
바야흐로 아이가 없어진 하소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판에 박은 듯한 푸념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
눈을 끔벅거리며 말할 기회만 노리던 중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허리를 꺾어 버린다.
「……아이 딱하기도 해라. 그러게 말이유……그렇지만 시주하십사고 온 게 아니라……
행여 쌀을 살려나 해서……아아주 무거워서요……」
그런 구슬픈 이야기보다 빨리 거래부터 하고 싶다는 표정이다.
진영은 값싼 동정까지도 인색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동정을 바라는 어머니가 밉기보다 딱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말이 미진한 어머니는 좀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무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좀 짐을 덜고 갈려구요.」
신중은 마루 끝에 바랑을 내리며 의사를 거듭 표시한다.
그제야 중의 수작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여태까지의 감정은 일단 수습하고
치마 밑을 추키며 재빨리 응수다.
「우리도 됫쌀을 팔아먹으니 기왕이면 사지요. 되나 후히 주세요」
중은 바랑을 끌러 놓고 쌀을 되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몹시 쌀되가 야위다고 보채고
중은 됫박 위에다 쌀을 집어 얹는 어머니의 팔을 떼밀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거래는 끝난 모양이다.
셈을 마친 어머니는 인사로,
「시님이 계신 절은 어디지요?」
「네? 아아 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절이지요」
학교 뒤라면 쌀을 팔고 갈 정도로 먼 곳은 아니다.
중이 가고 난 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애 진영아」
나직이 부른다.
진영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을 본다.
「문수를 그냥 둘라니 이리 가슴이 메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니 …… 절에 올려 주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진영의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절도 가깝고 신당이니 만만하고……세상에 너무 가엾어.
아무래도 혼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잠이 와야지」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이 처음 성당에 나가려고 결심했을 때
그것이 가공에 설정된 하나의 가장일지라도
다만 문수를 위한다는 명목만으로
자신이야 피에로도 오똑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인 맹목(盲目)은 끝내 맹목일 수 없었다.
미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진영은 긴 작대기에다 연금(捐金) 주머니를 여민
잠자리채 같은 것이 가슴 앞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
아주머니가 성급하게 돈을 몇 닢 던졌을 때,
잠자리채 같은 연금 주머니는 슬그머니 뒷줄로 옮겨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구경꾼 앞으로 돌아가는 풍각쟁이의 낡은 모자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계기로 하여 진영은 밖으로 나와 버렸다.
진영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성당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빨간 눈을 보았다.
문수 또래의 아이들이 신발을 신으며 나오는 것도 보았다.
여름 햇빛 아래 서 있는 성당이 가늘게 요동(搖動)하고 있는 것같이 진영에게는 느껴졌다.
아침부터 진영은 마루 끝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갑갑하게 그러지 말고 밖에라도 좀 나갔다 오라는 어머니의 말이
도리어 비위에 거슬려 진영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부여안는다.
갑갑한 때문만이 아니다.
진영은 일자리를 찾아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이다.
진영은 머리를 부여안은 채 도대체 어디를 가야하며
누구에게 매달려 밥자리를 하나 달라고 하겠는가,
더군다나 폐까지 앓고 있는 내가 --
진영은 문수를 생각했다.
살겠다고 버둥대는 어머니와 자기의 모습이 한없이 비루 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마당에는 대낮 햇빛이 쨍쨍 쏟아지고 있었다.
그늘이 짧아진 쌍나무의 둘레로 잉잉거리고 다니던 파리 떼들이 진영의 얼굴 위에 몰린다.
어머니는 장독대 옆에서 빨래에 풀을 먹이고 있었다.
넓적한 해바라기 잎사귀 사이의 그 찌드른 옆얼굴을 바라보는 진영은
바다에 떼밀려 다니는 해파리를 생각했다.
그렇게 둔하면서도 산다는 본능만은 가진 것, 그저 산다는 것,
진영은 어머니에 대한 잔인한 그런 주시를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었다.
진영은 성가시게 구는 파리를 쫓으며 마룻바닥에 드러눕는다.
하늘이 파랬다. 구름이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갑자기 바다같이 느껴졌다.
구름은 바다 위로 둥둥 떠내려가는 해파리만 같았다.
진영이 자신이 누워서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엎드려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착각이 든다.
해가 서쪽으로 좀 기울었다. 쌍나무의 그늘이 두서너 치나 늘어난 것 같다.
진영은 몸을 왼쪽으로 돌려서 마루 밑의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문이 삐걱 하더니 열린다.
땅을 보고 있던 진영의 눈에 우선 사람의 그림자가 먼저 들어왔다.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눈을 치떴을 때 그곳에 바랑을 짊어진 신중이 서 있었다.
초현실파의 그림같이 그림자를 밟고 선 신중의 소리 없는 기다란 모습.
드디어 합장을 하고 있던 신중이 입을 열었다.
「아씨!」
완전히 조화를 깨뜨린 소녀와도 같이 카랑카랑하게 맑은 목소리다.
바랑에 휘인 어깨는 아무래도 사십 고개일 터인데 --
신중은 부스스 일어나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진영의 형용할 수 없는 어두운 눈빛에 지친다.
마침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오는 어머니를 본 신중은 잠시 숨을 돌이킨 듯이,
「마나님!」
의연히 맑은 목소리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주저앉으며 긴 한숨을 쉰다.
「이날까지 부처님을 섬기고 잘 살 적에는 절마다 불을 켰건만 무슨 소용이 있읍디까.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도 헛말이더군……」
바야흐로 아이가 없어진 하소연이 시작되는 것이다.
판에 박은 듯한 푸념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
눈을 끔벅거리며 말할 기회만 노리던 중이 드디어 어머니의 말허리를 꺾어 버린다.
「……아이 딱하기도 해라. 그러게 말이유……그렇지만 시주하십사고 온 게 아니라……
행여 쌀을 살려나 해서……아아주 무거워서요……」
그런 구슬픈 이야기보다 빨리 거래부터 하고 싶다는 표정이다.
진영은 값싼 동정까지도 인색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
동정을 바라는 어머니가 밉기보다 딱한 생각이 들었다.
아직도 말이 미진한 어머니는 좀 어리둥절한 얼굴이다.
「무거워서 어디 가져갈 수가 있어야지요. 좀 짐을 덜고 갈려구요.」
신중은 마루 끝에 바랑을 내리며 의사를 거듭 표시한다.
그제야 중의 수작을 알아차린 어머니는 여태까지의 감정은 일단 수습하고
치마 밑을 추키며 재빨리 응수다.
「우리도 됫쌀을 팔아먹으니 기왕이면 사지요. 되나 후히 주세요」
중은 바랑을 끌러 놓고 쌀을 되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몹시 쌀되가 야위다고 보채고
중은 됫박 위에다 쌀을 집어 얹는 어머니의 팔을 떼밀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럭저럭 거래는 끝난 모양이다.
셈을 마친 어머니는 인사로,
「시님이 계신 절은 어디지요?」
「네? 아아 네. 바로 학교 뒤에 있는 절이지요」
학교 뒤라면 쌀을 팔고 갈 정도로 먼 곳은 아니다.
중이 가고 난 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애 진영아」
나직이 부른다.
진영은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을 본다.
「문수를 그냥 둘라니 이리 가슴이 메인다.
이렇게 흔적 없이 두다니 …… 절에 올려 주자」
어머니를 쳐다보고 있는 진영의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었다.
「절도 가깝고 신당이니 만만하고……세상에 너무 가엾어.
아무래도 혼백이 울면서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잠이 와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