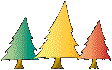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은 고개를 돌려 장독대의 해바라기를 바라본다.
한참만에,
「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삿군 대접을 했어요? 아이를 부탁할 생각을 했으면서……」
진영의 신선은 여전히 해바라기에 있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도 별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따, 별소릴 다 하네. 공은 공이고 신은 신이지.
하기야 뭐 시주 받은 쌀 팔고 가는 그게 진짜 중인가?」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럼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에 갈려구 해요?」
「누가 중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보고 가지」
진영은 잠자코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우선 쓰라고
돈 이만 환을 주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진영을 나무라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절에 갈 것을 동의하고 보니,
왜 그런지 아주머니에 대하여 변절(變節)을 한 듯 미안하다.
그리고 돈만 하더라고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았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호의가 빚이 되는 듯싶다.
훨씬 표현적(表現的)이다.
적어도 돈만 낸다면 절에서는 문수를 위한 단독적인 행사(行事)도 해 주기 마련이다.
진영은 자리에서 후딱 일어섰다.
해가 서산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렙토마이신 한 개를 사 들었다.
내낸 다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갈월동의 아주머니는 Y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자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삼분지 일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 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집 근처에 있는 S병원으로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쯤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 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이었던 것이다.
진자 의사는 그때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분주히 나오더니
바쁘게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을 진영의 눈살에 켕겼는지 우물쭈물 해치우더니 간호원에게,
「폐니시링 이 그람!」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페니실린이라면 병명을 몰라도 만병통치약으로 건달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영이 멍청히 섰는데 간호원은 소독도 안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다 뽑고 있었다.
진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가 뿌옇게 보였다.
약이 채 녹기도 전에 주사기에다 뽑은 것이다. 진영은 더 참지 못했다.
「안돼요, 녹기도 전에. 큰일날려구!」
앙칼지게 소리치며 진영은 약병을 뺏어서 흔들었다.
페니실린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앉았던 낯빛이 노란 할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엉거주춤하니 서 있는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
병원 문을 나섰다. 이미 밤이었다.
아까, <큰일날려구> 하면서, 약병을 빼앗던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 둥그렇게 그려진다.
참 목숨이란 끔찍이도 주체스럽고 귀중한 것이고 --
몇 번이나 죽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가.
진영은 배꼽이 터지도록 밤하늘을 보고 웃고 싶었다.
그러나 웃음이 터지고 마는 순간부터
진영은 미치고 말리라는 공포 때문에 머리를 곡 감쌌다.
사실상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은 미친 내 눈앞의 환각(幻覺)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대낮인지도 모른다.
진영은 머리를 꼭 감싼 채 집을 향하여 달음박질을 쳤다.
밀짚모자를 쓴 냉차(冷茶) 장수가 뛰어가는 진영의 뒷모습을 얼 없이 바라본다.
달무리진 달이 불그스름했다. 비라도 쏟아질 듯이 뭉뭉한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영의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이 가고 난 뒤 백중날을 기다렸다.
백중날은 죽은 사람의 시식(施食)을 하기 때문이다.
백중 전날에 어머니는 문수의 사진과 돈 이천 환을 가지고 절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 두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는
날이 원해지자 진영이도 과실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던 것이다.
B국민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진 길을 올라서니 이내 절 안마당이 보였다.
백중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아이구 정성도 지극해라.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콧물을 짠다.
어젯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설움을 들었을 주지 중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 중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갔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두 안 오시니 어떡허나」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 중을 쳐다본다.
「시님, 그만 우리 아일 먼저 해 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럼 댁부터 해 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무 님이라고 불린 신중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젯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 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은 고개를 돌려 장독대의 해바라기를 바라본다.
한참만에,
「그런데 왜 그리 중을 장삿군 대접을 했어요? 아이를 부탁할 생각을 했으면서……」
진영의 신선은 여전히 해바라기에 있었다.
자기가 하는 말에도 별반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따, 별소릴 다 하네. 공은 공이고 신은 신이지.
하기야 뭐 시주 받은 쌀 팔고 가는 그게 진짜 중인가?」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미웠다.
「그럼 왜 그런 중이 있는 절에 갈려구 해요?」
「누가 중보고 절에 가나? 부처님보고 가지」
진영은 잠자코 옳은 말이라 생각했다.
그와 동시에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우선 쓰라고
돈 이만 환을 주면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진영을 나무라던 일이 생각났다.
이렇게 절에 갈 것을 동의하고 보니,
왜 그런지 아주머니에 대하여 변절(變節)을 한 듯 미안하다.
그리고 돈만 하더라고 당연히 받을 돈을 받았건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았던 호의가 빚이 되는 듯싶다.
훨씬 표현적(表現的)이다.
적어도 돈만 낸다면 절에서는 문수를 위한 단독적인 행사(行事)도 해 주기 마련이다.
진영은 자리에서 후딱 일어섰다.
해가 서산에 아주 기울었다. 거리로 나왔다.
진영은 약국에서 스트렙토마이신 한 개를 사 들었다.
내낸 다니던 Y병원에는 아무래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약을 산 것이다.
갈월동의 아주머니는 Y병원의 의사가 같은 신자니 믿고 다니라고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주사분량인 한 병에서 겨우 삼분지 일만 놓아주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안 이상 그 병원에 다시 갈 수는 없었다.
약병을 만지며 길 위에 한 동안 서 있던 진영은 집 근처에 있는 S병원으로 들어갔다.
이웃이기 때문에 의사와 안면쯤은 있었다.
그러나 S병원은 엉터리 병원이었다.
진영은 모든 것이 서툴러 보이는 갓데려다 놓은 듯한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쳐다보며 약병을 내밀었다.
진찰도 하지 않고 주사만 맞으러 오는 손님을 의사는 언제나 냉대한다.
그래서 진영은 애당초 의사를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환자를 진찰하고 있던 의사가 뒤로 고개를 돌렸을 때 진영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의사가 아니었다. 그 나마도 근처에 사는 건달이었던 것이다.
진자 의사는 그때야 서류 같은 것을 들고 안에서 분주히 나오더니
바쁘게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었다.
청진기를 든 건달을 진영의 눈살에 켕겼는지 우물쭈물 해치우더니 간호원에게,
「폐니시링 이 그람!」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사라진다.
페니실린이라면 병명을 몰라도 만병통치약으로 건달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진영이 멍청히 섰는데 간호원은 소독도 안한 손으로
아주 서툴게 마이신을 주사기에다 뽑고 있었다.
진영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사기에 들어가고 있는 액체가 뿌옇게 보였다.
약이 채 녹기도 전에 주사기에다 뽑은 것이다. 진영은 더 참지 못했다.
「안돼요, 녹기도 전에. 큰일날려구!」
앙칼지게 소리치며 진영은 약병을 뺏어서 흔들었다.
페니실린을 맞으려고 기다리고 앉았던 낯빛이 노란 할머니가 주사기를 들고
엉거주춤하니 서 있는 간호원을 불안스럽게 보고 있다.
병원 문을 나섰다. 이미 밤이었다.
아까, <큰일날려구> 하면서, 약병을 빼앗던 자신의 모습이 어둠 속에 둥그렇게 그려진다.
참 목숨이란 끔찍이도 주체스럽고 귀중한 것이고 --
몇 번이나 죽기를 원했던 자기 자신이 아니었던가.
진영은 배꼽이 터지도록 밤하늘을 보고 웃고 싶었다.
그러나 웃음이 터지고 마는 순간부터
진영은 미치고 말리라는 공포 때문에 머리를 곡 감쌌다.
사실상 내가 미쳤는지도 모른다.
모든 일은 미친 내 눈앞의 환각(幻覺)인지도 모른다.
지금은 밤이 아니고 대낮인지도 모른다.
진영은 머리를 꼭 감싼 채 집을 향하여 달음박질을 쳤다.
밀짚모자를 쓴 냉차(冷茶) 장수가 뛰어가는 진영의 뒷모습을 얼 없이 바라본다.
달무리진 달이 불그스름했다. 비라도 쏟아질 듯이 뭉뭉한 더운 바람이 불어왔다.
진영의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이 가고 난 뒤 백중날을 기다렸다.
백중날은 죽은 사람의 시식(施食)을 하기 때문이다.
백중 전날에 어머니는 문수의 사진과 돈 이천 환을 가지고 절에 가서 미리 연락을 해 두었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는
날이 원해지자 진영이도 과실 바구니를 들고 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섰던 것이다.
B국민학교를 돌아 약간 비탈진 길을 올라서니 이내 절 안마당이 보였다.
백중맞이를 하느라고 한창 바쁜 절에는 동네 아낙네들이 와서 일을 거들고 있었다.
「아이구 정성도 지극해라.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니는 눈에 손수건부터 가져간다.
「스님, 우리 아이 천도 좀 잘 시켜 주세요. 부탁입니다. 너무 가엾어……」콧물을 짠다.
어젯저녁에 실컷 어머니의 설움을 들었을 주지 중은 새삼스럽게 그 말이 탐탁해질 리가 없다.
주지 중은 극히 사무적으로,
「그런데 첫째로 하갔다던 서장 부인이 아직두 안 오시니 어떡허나」
잠시 생각에 잠긴다.
무슨 서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 절에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손님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비굴한 웃음을 띠면서 주지 중을 쳐다본다.
「시님, 그만 우리 아일 먼저 해 주세요」
주지는 한동안 어머니를 보고 있더니,
「……그럼 댁부터 해 드릴까……」
주지는 그렇게 작정하고 마침 지나가는 중을 부른다.
「아우님!」
아무 님이라고 불린 신중은 돌아본다.
얼굴이 쪼글쪼글 쪼그라진 그 신중은 아직도 팽팽한 주지에 비하여 훨씬 더 늙어 보인다.
게다가 표정마저 앙상하다.
「어젯저녁에 이천 환 낸 분인데 아직 서장 댁이 안 오시니 우선 하나라도 먼저 끝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