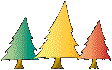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 버린다.
진영과 어머니는 법당 옆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라다 보이는 산마루에 막 해가 솟고 있었다.
그 영롱한 아침을 진영은 벽화(壁畵)처럼 감동 없이 대한다.
진영은 최저의 돈을 내고 첫째로 하겠다고 새벽부터 온 것이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 짓이었던가를 생각한다.
공양을 들고 젊은 중이 온다.
「여보세요, 그 키 큰스님은 안 계시나요?」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을 두고 묻는 말이다.
「그이는 절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젊은 중은 간단히 대답하고 법당으로 들어간다.
곧 시식 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조는 듯한 염불을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중이 아니었던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기왕이면 굿 잘하는 무당으로 -- 하는 따위의 기분이었다.
중은 염불을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히 섰는 진영을 흘겨본다.
보라빛깔의 원피이스를 입은 진영의 허리는 말할 수 없이 가느다랗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만 검다.
중은 여전히 마땅치 않게 진영을 흘겨본다.
진영은 중의 눈길을 느낄 적마다 재촉을 당한 듯이 어색하게 엎드려 절을 했다.
진영은 중의 마음이 염불에 있지 않고, 잿밥에 있다는 속담같이
지금 저 중의 마음도 염불에 있지 않고
절에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진영은 중과 무슨 대결이라도 한 듯이 점점 몸이 피로해지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중이 씨근벌떡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 댁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들인 모시 장삼(長衫)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佛前)에서 영전(靈前)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이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결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빳빳한 은행에서 갓나온 듯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 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빳빳한 새 돈은 흡사 백 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 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리 속에 피가 꽉 차 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 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격심히 저주하는 것이었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 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들(施食石)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쌌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을 감던 문수의 손결이 느껴진다.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 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갛게 충혈 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일없소.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미치고 법당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 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조반을 자셔야 할 턴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 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 버린다.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貨幣)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計算)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 입은 그 서장은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 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 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밥을 얻어 먹으려 절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냥 걸어가는 진영을 만류 못할 것을 아는 어머니는 뜰에 서성거리고 있는 늙은 중에게
「그만 갈랍니다, 시님」
「이크, 아침이나 잡수시지…… 갈려오?」
굳이 잡지는 않았다. 그는 절 문까지 전송을 하며,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은 울화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불신 시대 - 박경리
주지의 말투는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대답 대신 진영의 모녀를 훑어보더니
돈의 액수가 심에 차지 않아서 무뚝뚝하게 그냥 가 버린다.
진영과 어머니는 법당 옆에 서로 등을 보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바라다 보이는 산마루에 막 해가 솟고 있었다.
그 영롱한 아침을 진영은 벽화(壁畵)처럼 감동 없이 대한다.
진영은 최저의 돈을 내고 첫째로 하겠다고 새벽부터 온 것이
얼마나 얌통머리 없는 짓이었던가를 생각한다.
공양을 들고 젊은 중이 온다.
「여보세요, 그 키 큰스님은 안 계시나요?」
어머니는 쌀을 팔러 온 중을 두고 묻는 말이다.
「그이는 절에 잘 붙어 있지 않아요」
젊은 중은 간단히 대답하고 법당으로 들어간다.
곧 시식 불공이 시작되었다.
진영은 늙은 중이 목탁을 두드리며 조는 듯한 염불을 시작하자 적잖게 실망했다.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찬 주지중이 아니었던 것이 섭섭했던 것이다.
기왕이면 굿 잘하는 무당으로 -- 하는 따위의 기분이었다.
중은 염불을 하면서 열심히 절을 하고 있는 어머니 옆에 멍청히 섰는 진영을 흘겨본다.
보라빛깔의 원피이스를 입은 진영의 허리는 말할 수 없이 가느다랗다.
핏기 없는 얼굴에는 눈만 검다.
중은 여전히 마땅치 않게 진영을 흘겨본다.
진영은 중의 눈길을 느낄 적마다 재촉을 당한 듯이 어색하게 엎드려 절을 했다.
진영은 중의 마음이 염불에 있지 않고, 잿밥에 있다는 속담같이
지금 저 중의 마음도 염불에 있지 않고
절에 와서 예배를 하지 않는 내 태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
진영은 중과 무슨 대결이라도 한 듯이 점점 몸이 피로해지는 것이었다.
얼마 동안이 지난 것 같았다.
주지중이 씨근벌떡거리며 법당으로 쫓아왔다.
「아우님 빨리 하시오. 지금 막 서장 댁이 오셨구려. 대강대강 하시오」
주지는 법당 구석에 걸어둔 먹물들인 모시 장삼(長衫)을 입으며 서두르는 것이었다.
늙은 중은 불전(佛前)에서 영전(靈前)으로 자리를 옮긴다.
제대로 불경이나 끝마쳤는지 의심스러웠다.
아까 공양을 나르던 젊은 중이 이번에는 널따란 그릇을 들고 들어온다.
그는 진영의 모녀를 돌아다보며, 영가 앞으로 오라고 손짓한다.
진영은 문수의 사진이 놓인 앞에 가서 엎드렸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것이었다.
문수의 손결이 생생하게 마음속에 느껴진 것이다.
「문수야, 많이많이 먹어라. 불쌍한 내 자식아!」
진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이처럼 슬프게 들은 적은 없었다.
어머니는 향을 꽂고 빳빳한 은행에서 갓나온 듯한 십 환짜리 스무 장을 영전에 놓았다.
진영도 일어서서 향을 꽂았다.
그리고 돌아섰을 때 중이 목을 길게 뽑아 가지고
영전에 놓인 돈을 기웃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 빳빳한 새 돈은 흡사 백 환권으로 보이는 것이었다.
진영은 송구스런 생각에서 고개를 푹 수그리고 말았다.
그릇을 들고 온 젊은 중이 돈을 옆으로 밀어 놓으면서 시무룩하게,
「영가 노자가 너무 적군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
동무하고 쓰고 놀다가 돌아가지 않겠어요?」
진영은 머리 속에 피가 꽉 차 오는 것을 느낀다.
돈을 그렇게 밖에 준비하지 못한 어머니의 인색함을 격심히 저주하는 것이었다.
젊은 중은 들고 온 그릇에다 영가 앞에 차린 음식을 조금씩 덜어놓는다.
나물, 떡, 자반, 과실, 그렇게 차례차례 손이 간다.
마침 먹음직스런 약과에 손이 닿자 별안간 목탁을 치던 중이,
「그건 그만 두구려!」 바락 소리를 지른다.
젊은 중은 진영을 힐끗 보면서 총총히
바깥 시식들(施食石)로 음식을 버리러 나가는 것이었다.
진영은 기가 막혔다. 처음부터 거래임에는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어지간한 감정도 폭발 아니할 수 없었다.
진영은 양손으로 얼굴을 푹 쌌다. 울음이 터진 것이다.
누구에게도 향할 수 없는 역정을 그는 울음 속에다 내리 퍼부었다.
울음 속에 그 목을 감던 문수의 손결이 느껴진다.
미칠 듯한 고독과 그리움이 치솟는 것이었다.
음식을 버리고 돌아온 젊은 중은 과실을 모으며,
「이걸 가져 가셔야지. 보자기를……」
하며, 어머니를 돌아본다. 진영은 새빨갛게 충혈 된 눈으로 젊은 중을 노리며,
「일없소. 그만두시오.」
진영의 목소리는 악을 쓰는 것 같았다.
일을 다 미치고 법당밖에 나온 늙은 중이,
「왜 가져온 걸 안 가져가슈」
쳐다보지도 않는 진영이 대신 어머니가,
「뭐 그걸……」
진영의 얼굴을 어머니는 숨어 본다.
늙은 중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댁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의 눈이 번득였다.
「조반을 자셔야 할 턴데 너무 일러서 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좀 기다리실 까요」
젊은 중은 그런 말을 남기고 가 버린다.
진영은 법당 축돌 위에 주저앉았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그저 돈이 있어야지요> 하던 말이 되살아온다.
물론 처음부터 거래였다.
그렇다면 화폐(貨幣)의 액수에 따라 문수에 대한 추모의 정이 계산(計算)된단 말인가.
진영이 그러한 울분에 젖어 있을 때
말쑥하게 차려 입은 그 서장은 부인인 듯싶은 젊은 여인이
주지 중에게 인도되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잠깐 ;후 불경 읽는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밖으로 흘러 나왔다.
잠들었던 부처님이 처음으로 일어나서 귀를 기울일 만한 뱃속에서 밀어낸 목소리였다.
진영은 발딱 일어선다.
「어머니, 그냥 갑시다.」
밥을 얻어 먹으려 절에 온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냥 걸어가는 진영을 만류 못할 것을 아는 어머니는 뜰에 서성거리고 있는 늙은 중에게
「그만 갈랍니다, 시님」
「이크, 아침이나 잡수시지…… 갈려오?」
굳이 잡지는 않았다. 그는 절 문까지 전송을 하며,
「당신네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진영은 울화보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