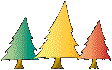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내리막길에서 잡풀을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여비도 떨어진 낯선 여관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덩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는 것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수년 내로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解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 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랑빛, 파랑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직감적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 병으로, 혹은 후춧가루 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의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잖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蔓延)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환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位牌)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을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게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하게 괸 샘터에서 물을 긷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少女)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
진영은 울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였다는 것을 뉘우친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가(市街)는 너절했다.
구릉을 지은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過渡期)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있었다.
이러한 도시(都市)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街路樹)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진영은 얄팍한 턱을 괸다.
꿀벌처럼 도시의 소음이 귓가에 울려오는데
고급 승용차가 산장(山莊)이 있는 고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진영은 산등성이에서 그것을 보니
그것은 별것이 아닌 한 마리의 딱정벌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꼬불꼬불 기어가는 딱정벌레.
진영은 새삼스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충동들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진영은 이유 없이 자기를 다잡아 보았다. 사실 그러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딱정벌레 같아서 어쨌단 말 이가,
진딧물 같고, 가로수, 구름, 그래서…… 불신 시대 - 박경리
내리막길에서 잡풀을 뽑으며 진영은 말없이 울었다.
여비도 떨어진 낯선 여관방에다 문수를 혼자 두고 가는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었다.
진영은 불덩어리 같은 이마를 짚는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트고 하는 것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수년 내로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쑤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욱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解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밤마다 귓가에 울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 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랑빛, 파랑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꽉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 두었던 몸을 끌고 H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이 멀다고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나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직감적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 병으로, 혹은 후춧가루 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의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잖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蔓延)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던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환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환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보내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位牌)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을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갔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밉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걸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게딱지만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하게 괸 샘터에서 물을 긷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少女)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 --
진영은 울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였다는 것을 뉘우친다.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시가(市街)는 너절했다.
구릉을 지은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딧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過渡期)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있었다.
이러한 도시(都市)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街路樹)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진영은 얄팍한 턱을 괸다.
꿀벌처럼 도시의 소음이 귓가에 울려오는데
고급 승용차가 산장(山莊)이 있는 고개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진영은 산등성이에서 그것을 보니
그것은 별것이 아닌 한 마리의 딱정벌레 같은 것이라 생각한다.
꼬불꼬불 기어가는 딱정벌레.
진영은 새삼스레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무의미하기 짝이 없는 충동들이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진영은 이유 없이 자기를 다잡아 보았다. 사실 그러했다.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딱정벌레 같아서 어쨌단 말 이가,
진딧물 같고, 가로수, 구름, 그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