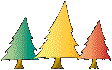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은 머리를 쓸어 올린다.
모든 괴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결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기처럼 절조 없이 두 신전에 참배했다.
그리고 제물과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것 역시 문수와 나의 중계를 부탁한 신에게 주는 수수료(手數料)였는 지도 모른다.
그 수수료는 실제에 있어서 중의 몇 끼의 끼니가 되었다.
결국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고, 문수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영은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숱한 머리를 다시 쓸어 올린다.
파르스름한 손이 투명할 지경이다.
신비라고, 예고라고, 꿈, 아니야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지,
문수의 죽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위적인 실수 아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면 죽는다고? 물론 죽는 게지, 노쇠해서 죽는 거지……
설령 아이가 그대 이미 죽을 목숨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그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사람을,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왜 생각은 해.
아니 아까는 없다고 하고선…… 아니야 모르겠어.
사람을,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반항을 해야겠다.
모든 약탈 적인 살인자(殺人者)를 저주해야겠다.
진영은 술이라도 마신 사나이처럼 두서도 없는 혼잣말을 언제까지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영의 해사한 얼굴에 그늘이 진다.
한없이 높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시가에는 마치 색종이를 찢어놓은 것같이 추석 치레가 오가고 있었다.
진영의 열에 들뜬 눈이 그것을 쳐다보며 일어선다.
그에게는 이미 반항 정신도, 아무 것도 없었다.
허황한 마음의 미로(迷路)가 끝없이 눈앞에 뻗어 있을 뿐이었다.
진영은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며, 산을 내려온다.
천막집에서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또다시 이곳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라는
아까의 뉘우침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음력설이 임박해진 추운 날,
갈원동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푹 뒤집어쓰고 찾아왔다.
웬일인지 몸가짐이 평소보다 좀 산란해 보였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 기가 막혀서……」
「……?」
아주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듯이 가만히 앉았다가,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해?」
진영은 의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지난 오월 달에 가져 간 돈을 이자 한푼 못 받고 그만……」
진영의 변해 가는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오월이면 진영의 곗돈을 찾을 달이다.
그리고 계가 끝나는 달이기도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벌서 몇 달 전부터 곗돈을 받으려고 몸이 달아서 다니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던 것이다.
「빌려 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십만 환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계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니?
설마 내가 잘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밑천 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 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오월 달에 빌어 간 오십만 환의 이자라고는 한푼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 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이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 주겠노라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 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었으나,
웬 까닭인지 심씨란 사람이 약속 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 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뜻하게 종교를 이용했군요」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려 깐다.
「글세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 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떡허실 작정이에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지 생각 같아서는 김씨가 일은 봐 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은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에게 딴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럼 김씨가 일 안 봐 줄 적에 너가 좀 협조해 줄 수 있을까?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 보일 것 같아」
「글세……」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불신 시대 - 박경리
진영은 머리를 쓸어 올린다.
모든 괴로움은 내 속에 있었다.
모든 모순도 내 속에 있었다.
신도, 문수의 손결도 내 속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곳에도 실제 있지는 않았다.
나는 창기처럼 절조 없이 두 신전에 참배했다.
그리고 제물과 돈을 바쳤다.
그러나 그것 역시 문수와 나의 중계를 부탁한 신에게 주는 수수료(手數料)였는 지도 모른다.
그 수수료는 실제에 있어서 중의 몇 끼의 끼니가 되었다.
결국 나는 나를 속이려고 했고, 문수는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을 것이다.
진영은 이마 위에 흘러내리는 숱한 머리를 다시 쓸어 올린다.
파르스름한 손이 투명할 지경이다.
신비라고, 예고라고, 꿈, 아니야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지,
문수의 죽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인위적인 실수 아니었던가.
인간은 누구나 나이 들면 죽는다고? 물론 죽는 게지, 노쇠해서 죽는 거지……
설령 아이가 그대 이미 죽을 목숨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그렇게 죽이고 싶지는 않았다.
도수장의 망아지처럼…… 사람을,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신을 왜 생각은 해.
아니 아까는 없다고 하고선…… 아니야 모르겠어.
사람을, 사람을 좀 미워해야겠다. 반항을 해야겠다.
모든 약탈 적인 살인자(殺人者)를 저주해야겠다.
진영은 술이라도 마신 사나이처럼 두서도 없는 혼잣말을 언제까지나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영의 해사한 얼굴에 그늘이 진다.
한없이 높은 가을 하늘에 구름이 지나가는 것이었다.
시가에는 마치 색종이를 찢어놓은 것같이 추석 치레가 오가고 있었다.
진영의 열에 들뜬 눈이 그것을 쳐다보며 일어선다.
그에게는 이미 반항 정신도, 아무 것도 없었다.
허황한 마음의 미로(迷路)가 끝없이 눈앞에 뻗어 있을 뿐이었다.
진영은 버릇처럼 머리를 쓸어 올리며, 산을 내려온다.
천막집에서 누렇게 뜬 얼굴들,
진영은 또다시 이곳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런 존재라는
아까의 뉘우침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음력설이 임박해진 추운 날,
갈원동 아주머니가 목도리를 푹 뒤집어쓰고 찾아왔다.
웬일인지 몸가짐이 평소보다 좀 산란해 보였다.
「나 의논할 게 좀 있어서 왔는데…… 참 기가 막혀서……」
「……?」
아주머니는 말을 꺼내기가 거북한 듯이 가만히 앉았다가,
「저, 말이야, 돈을 좀 빌려준 사람이 죽었구나. 어떻게 해?」
진영은 의심스럽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지난 오월 달에 가져 간 돈을 이자 한푼 못 받고 그만……」
진영의 변해 가는 표정을 보고 아주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린다.
오월이면 진영의 곗돈을 찾을 달이다.
그리고 계가 끝나는 달이기도 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벌서 몇 달 전부터 곗돈을 받으려고 몸이 달아서 다니던 사람이 몇 명이 있었던 것이다.
「빌려 준 돈이 얼마나 돼요?」
진영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십만 환이야.」
진영은 속으로 놀랐다.
계를 해서 빚만 뒤집어 쓴 줄 알았는데
그런 대금의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영은 차갑게 아주머니를 쳐다본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자식도, 남편도 없는 내겐 그것만이 남겨진 것이었어. 낸들 얼마나 돈을 떼었니?
설마 내가 잘되면 빚이야 갚고 살겠지만,
그때 그 돈마저 내주게 되면 난 아주 영영 파멸이지」
진영은 어디 밑천 든 장사였더냐고 오금을 박아 주고 싶었다.
아주머니는 한참만에 눈물을 닦고 일의 경위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 내용인즉 죽은 사람은 돈을 쓴 회사의 전무였으며,
오월 달에 빌어 간 오십만 환의 이자라고는 한푼도 받아본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불안해진 아주머니는 전무에게 원금을 뽑아 달라고 졸랐으나
영 내놓지 않아서 생각다 못해 같은 신자에게 의논을 했더니
그이의 남편인 김씨가 일을 봐 주겠노라 하기에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그 김씨란 사람이 수단이 비상하여 마침내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게 되고,
그 며칠 후에 전무는 교통 사고로 죽은 것이라 한다.
사장 명의로 된 약속 어음을 받은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었으나,
웬 까닭인지 심씨란 사람이 약속 어음을 도무지 주지 않고
무슨 협잡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를 의심한다거나 비위를 거슬러 놓는다면 돈 준 사람도 없는 지금,
여자인 내가 어떻게 사장이란 사람에게 받아낼 수도 없고,
이렇게 속이 탄다고 하면서 아주머니는 가슴을 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진영은,
「대관절 그 전무란 사람을 어떻게 알고서 그런 대금을 주었어요?」
「저…… 저 왜 그 상배 있잖아, 그 상배 아버지야」
「뭐예요? 영세 받았다는 상배 학생 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얼굴이 빨개진다.
진영은 기가 딱 막혔다.
그리고 보니 사업 때문에 상배 아버지가 서울로 오게 될 거라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사뜻하게 종교를 이용했군요」
아주머니는 진영의 눈길이 부신 듯이 눈을 내려 깐다.
「글세 지금 생각하니 모두가 계획적이었어. 영세 받은 것만 해도……」
「신용 보증으론 종교보다 더 실한 게 있어요?」
아주머니는 비꼬는 진영의 말에 풀이 죽는다.
진영은 풀이 죽는 아주머니로부터 눈을 돌렸다.
영세를 받았기 때문에 믿고 돈을 준 아주머니,
신자이기 때문에 믿고 일을 맡긴 아주머니,
단순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영은 다시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다.
그의 약점을 추궁할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떡허실 작정이에요?」
「글쎄 말이다. 그래서 의논이지.」
「지 생각 같아서는 김씨가 일은 봐 주되
어음은 아주머니가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음은 찾아간다고 일을 안 봐주면?」
「그땐 벌써 그이에게 딴 야심이 있었다고 봐야지요」
「그럼 김씨가 일 안 봐 줄 적에 너가 좀 협조해 줄 수 있을까?
여자 혼자니 아무래도 호락호락 보일 것 같아」
「글세……」
그런 일에는 아주 딱 질색이었다.
|